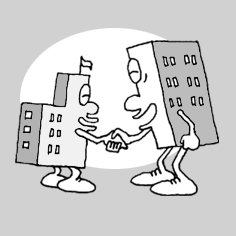
▷대기업들은 ‘실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42%), ‘재교육이 필요하다’(69%) 등 신입사원에 대한 불만이 크다. 삼성전자는 매년 6000명의 이공계 신입사원 재교육비로 800억 원 이상을 쓰는 형편이다. 그러나 대전전자디자인고 출신은 다르다. 정 교장은 1학년생들에게 3년 후 필요해질 기술도 교육한다. 5년 후 제품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취업 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된다.
▷기업과 학교가 손잡는 산학(産學)연계, 맞춤형 주문식 교육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 반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신주과학공원원구(園區)도 그 현장이다. 유럽의 명품 산지에는 그 제품을 집중 연구하는 대학이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 대학들은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해마다 교과과정을 바꾼다. 인턴 과정도 산학연계의 산물이다.
▷지난달 충북 금왕공고와 주성대, 하이닉스반도체가 맞춤 교육 협약을 맺었다. 실업고, 전문대, 기업체 ‘3자 협력’의 첫 모델이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부문은 고려대 한양대 등 전국 10개 대학에 ‘정보통신트랙’이라는 1년 단위 교과과정을 내년 초에 개설한다. 삼성은 원하는 인재를 길러 달라며 각 대학에 5년간 7억 원씩 지원한다. 이 ‘트랙’을 이수한 학생은 삼성에 우선 채용된다. 현대자동차, LG전자, 만도 등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개설한 주문형 교육과정도 있다. ‘맞춤 교육으로 취업문 뚫기’는 한국 고용시장의 새 트렌드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횡설수설 >
-

후벼파는 한마디
구독
-

특파원 칼럼
구독
-

정용관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이진영]교육감 출마하며 “조국 딸 못 지켜 미안하다”는 전 부산대 총장](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6/13104205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