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부모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1980년대 이전 입양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 당시 친부모가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기기보다 경찰서나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를 다른 사람이 입양기관에 등록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창원(李昌爰·48) 홍보과장은 “해외 입양인이 모국 방문기간에 부모를 찾는 데 성공한 비율은 30% 정도”라며 “아이를 버린 미혼모들이 자식을 만나길 거절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입양인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출신 입양기관에서 알 수 있으면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의 정확성이 문제가 된다.
해외입양인연대 최진경(崔眞卿·34) 간사는 “입양인에게 친부모의 주소지를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모의 프라이버시보다 입양인이 부모를 찾을 권리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입양인은 모국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실망하기도 한다.
비즈니스 위크지의 편집자인 입양인 엘리자베스 란숙 페리 워이키(이란숙·27·여) 씨는 “한국 출신 해외 입양인은 성장 과정에서 모국의 문화, 언어, 음식 등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면서 “하지만 한국을 찾았을 때 차별받으면 모국에 다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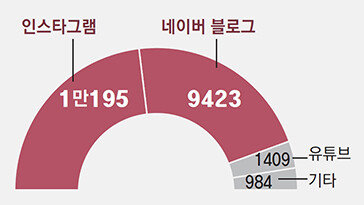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