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얼’과 프랑스 ‘품위’의 조화=1959년 프랑스 정부는 주한 대사관 설계를 현상 공모했다. 7명의 응모작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한국 근대건축의 거장 고(故) 김중업(1922∼1988) 선생의 손을 들어 줬다. 건물의 조형과 배치에서 한국의 정서와 프랑스의 우아한 품위를 잘 접목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두 건물에서 시선을 사로잡은 부분이 지붕이다. 노출 콘크리트 지붕은 몸체에서 분리돼 허공에 떠 있다. ‘살아 움직이는 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김중업 선생은 2차원의 선으로 3차원의 입체를 만들어 냈다.
대사관저의 지붕은 남성적이다. 끝이 역동적으로 들어 올려진 지붕 선은 한옥의 기와지붕에서 나타나는 투박하면서도 기운찬 상승감을 보여 준다. 지붕을 떠받치는 육중한 기둥은 건물 전면에 따로 배치해 실제보다 웅장한 느낌을 준다. ▽40여년 세월, 상처입은 건물=대사관저가 1962년 지어졌을 당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면 업무동은 흑백사진으로만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원래 업무동 지붕은 날렵하면서 리듬감 있는 곡선이었다. 가운데 부분만 4개의 기둥으로 가볍게 들어 올려져 경쾌한 인상을 줬다.
하지만 지붕을 새로 하면서 처음의 조형성은 훼손됐다. 12개의 기둥 위에 얹힌 지금의 지붕은 사각 형태에 그 끝만 살짝 접어 올려 있다. 지금 완만한 구릉은 파헤쳐져 조경 공사를 했고, 대사관 앞뒤로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 지붕과 몸체가 자아내던 풍경은 예전만 못하다.
그것마저 일반인은 사진으로만 접할 수 있다. 프랑스대사관은 외부에 공개돼 있지 않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수도권 >
-

광화문에서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수도권/메트로 파일]잠원동 반포한양 559채로 재건축 外](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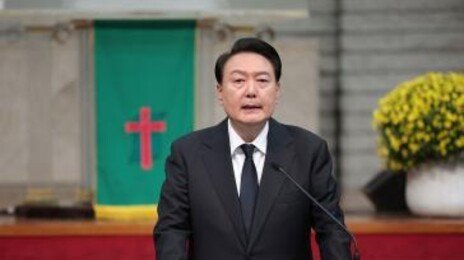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