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던 차에 할 말을 했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전교조를 탄생시킨 주역이 저렇게 매몰찬 질타를 할 수 있느냐는 사람도 있다.
전교조는 그가 청와대에 입성하자 진보적 교육정책을 펴는 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를 못한 것 같다. 전교조로서는 점점 시장주의 교육노선으로 기울어지는 조짐을 보이는 참여정부에 대해 우려해 왔고, 김 전 비서관을 통해 그런 조짐을 차단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잘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이 잘 안 되는 것이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교사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속성이 드러났고, 초기 전교조 활동이 보여 준 ‘학생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가는 데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전교조의 정체성 상실로 창립 주역이었던 자신의 ‘초심’이 상실되어가는 체험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서로 친화성을 보일 것 같았던 전교조의 교육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관이 대립하고, 그 대결의 연장선에서 김 전 비서관과 전교조가 맞부딪치고 있다.
그렇다고 둘 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며 재단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교육정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 즉, 효율성, 경쟁 등 ‘시장주의’로 경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공공성, 평등성 등 ‘공동체주의’를 고수하는 전교조의 교육정책 사이에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에 사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자는 서로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 더욱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뿐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장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접목시키는 교육정책을 마련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양측의 대립된 입장을 보면서 합의문화의 미성숙을 목도하게 된다. 억압시대의 투쟁에 익숙한 사람이 정작 정책을 펼 때는 민주적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자신의 입장만을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초심을 잊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이러한 자기점검은 전교조에도 해당될 것이다. 노동조합으로서 정부와의 단체교섭에 익숙한 나머지 학생에 대한 보살핌을 소홀히 해 설립 이념이 희석되고 있지 않은지, 전교조 활동이 교사들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이나 제도투쟁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 현 전교조 지도부도 전교조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수용해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왜 국민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지 등의 종합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화 이후 시대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타협하는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대화적 훈련 과정을 통해 권력과 시민사회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전교조 사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기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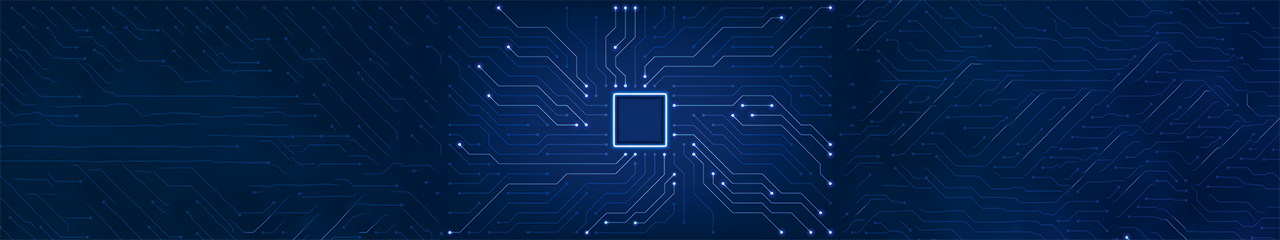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청소년 SNS 중독… 우회 낳는 ‘규제’보다 ‘조절 교육’이 효과적[기고/김효원]](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6/131042006.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