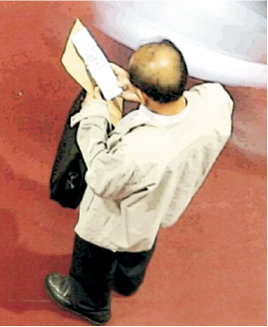
본보가 7일 단독 입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수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서민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은 지역별 남녀별 수급액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노후 보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명당 한 명꼴로 수령=2007년 1월 1일 현재 연금 가입자 수는 1773만9939명이며 이 가운데 연금 수령자는 10.5%인 185만87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 723만2326명의 25.7%에 해당한다. 60세 미만이지만 장애·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면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명당 2명꼴로 연금을 받는 셈이다.
1인당 받은 월평균 연금액은 18만8394원이며 수급자의 67.8%가 월 20만 원 미만의 소액 수급자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43만5921원의 절반도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국민연금만으론 생계를 꾸려 나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급자의 92.6%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월 80만 원 이상의 고액 수급자는 0.1%(1473명)에 불과했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이 많아 소액 수급자의 비중이 높다”면서 “2010년경에는 60만 원 이상 중상위권 수급자가 3∼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금도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지역별 1인당 평균 연금액은 차이가 크다. 울산이 24만1248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만115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부산 등 대도시는 대체로 20만 원대였다. 전북(14만9861원) 전남(14만3142원)은 최하위권이었다. 전남의 경우 20만 원 미만의 소액 수급자 비율이 84.3%로 가장 높았다.
80만 원 이상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다. 서울과 부산이 전체 고액 수급자의 54.3%(800명)를 차지했다. 40만 원 이상∼80만 원 미만의 중상위권 수급자도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반면 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높았다. 1인당 연금액이 가장 적은 전남이 25.4%로 가장 높고 고액 수급자가 가장 많은 서울은 6.3%로 가장 낮았다.
관동대 국제경영학과 김상호 교수는 “농어촌은 소득이 낮고 노인 인구가 많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의 소득격차가 연금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미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녀 격차도 뚜렷=수급액은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1만2250원으로 여자(13만5264원)보다 56.9% 많았다. 수급자도 남자(111만8973명)가 여자(73만9796명)보다 많다. 하지만 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여자(11.5%)가 남자(9.9%)보다 높았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80만 원 이상 고액 수급자 가운데 여자는 1%(15명)뿐이다. 전국 16개 자치단체별 80만 원 이상 남자 고액 수급자가 없는 지역은 없지만 여자는 서울(7명) 부산(3명) 광주(1명) 경기(3명) 충남(1명) 등 5개 지역에서만 고액 수급자가 있었다. 연금액 60만∼80만 원 미만인 중상위권 수급자도 남자가 99%로 나타났다.
여자의 98.8%는 40만 원 미만의 중하위 또는 소액 수급자다. 전체 여성 수급자의 78.7%가 20만 원 미만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여자 수급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가입 기간이 대체로 짧은 편이며 임금수준이 낮아 남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어 여성 고액 수급자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