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만 되면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게 한국이지만 학문과 양심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학사회도 물밑에서 들끓고 있다. 그 술렁거리는 중심에 폴리페서가 있다.
대선 때면 주자 진영으로 발길을 옮기는 폴리페서의 출몰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대선 초기부터 폴리페서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의 문을 두드리는 교수의 수가 이회창 전 총재가 후보로 나선 2002년 대선 때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우선 유력 대선주자가 2명일 뿐만 아니라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캠프가 구축한 전국의 교수 중심 포럼이 30여 개나 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크고 작은 대선 캠프에서 공개리에 혹은 물밑에서 활동하는 교수가 1000명은 넘을 것”이라며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그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왜 이렇게 많을까.
서울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내가 학문적으로 낮게 평가했던 교수가 대선캠프에 들어간 뒤 어느 날 총장을 상대하며 대학 행정에 관여하는 중량급이 돼 나타나면 허탈감이 밀려오면서 ‘너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교수들의 중용이 폴리페서 현상을 부추겼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폴리페서는 전체 교수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것도 소수 학과에 치우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평생 닦은 학문으로 국민과 나라에 기여하는 것은 지식인의 사명이라는 점에서 폴리페서 자체를 나쁘게 볼 수도 없다. 박 전 대표의 자문교수인 연세대 김영세(경제학) 교수는 “교수의 현실정치 참여는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염불(학문의 현실정치 적용)보다 잿밥(학문을 통한 정치적 출세)에만 관심을 쏟는 폴리페서들의 횡행은 오늘도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불을 밝히는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꺾는다.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즘의 파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박제균 기자 phark@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동해 목선 탈북 1호, 강원 JC 회장이 되다[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66951.2.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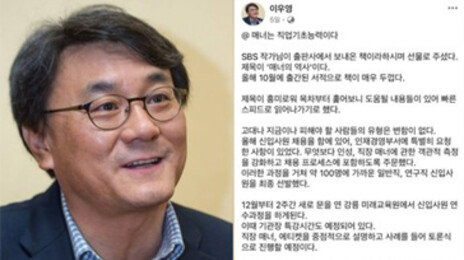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