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안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 방화문을 통과해 다시 두께 20cm가 넘는 육중한 철문을 열고 수장고 내부로 들어서자 다양한 생물표본을 보관한 이동식 수장 설비가 줄지어 나타났다.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생물자원을 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한국 땅에 있는 각종 생물의 유전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일이다.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한 수백 년 뒤에는 수장고에 보관된 생물표본의 유전자를 이용해 영화 ‘쥐라기공원’에서 화석의 유전자로 공룡을 되살려 내듯 멸종된 동물을 복원하거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 수장고는 한국판 ‘노아의 방주’로 불린다.》
○ 생물표본 보전 위해 첨단기술 총동원
국립생물자원관 수장고의 면적은 1만2350m²로 동양 최대 규모. 또 이곳에 보관된 생물표본은 식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균류 및 미생물 등 118만여 점에 이른다.
수장고는 생물 표본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이중, 삼중의 각종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리히터 규모 6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는 기본이다.
불이 나면 천장에서 할론가스가 뿜어져 나와 자동으로 진화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특수 형광등이 설치돼 조명의 빛 때문에 표본이 변색 및 탈색되는 것을 방지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의 노태권 연구사는 “생물표본을 보전하기 위해 수장고 안의 온도는 365일 18, 19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수장고 안에 침입한 균이 번식할 수 없도록 습도도 50% 수준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생물표본 관리의 가장 큰 적은 각종 해충이다. 이 때문에 수집된 생물자원은 여러 차례의 저온소독과 훈증을 거쳐 알코올에 담그거나 건조시켜 보관한다. 이 과정에서 숨어 있는 해충과 균은 박멸된다.
해당 생물자원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수집됐는지 알려 주는 라벨 종이를 비롯해 표본을 종이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접착제, 알코올 증발을 막는 병뚜껑 등도 해외에서 직수입한 특수 제품들이다.
수장 설비들은 해충이 뚫을 수 없는 강철로 만들어졌다. 수장설비 안은 다시 서랍이 달려 있어서 해충이 생물 표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 뒤늦게 만들어진 자연사박물관
여러 대학에 생물표본을 보관하는 시설들이 있긴 하지만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17, 18세기부터 전 세계에서 생물자원들을 수집하고 생물 표본을 확보해 왔다.
미국은 전역에 1176개의 자연사박물관이 있으며 이 밖에도 독일(605개) 영국(297개) 프랑스(233개) 일본(150개) 등이 많은 자연사박물관을 갖추고 있다.
선진국이 아니라도 중국(23개) 인도(16개) 태국(12개) 말레이시아(11개) 방글라데시(10개) 등이 한국보다 많은 자연사박물관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에도 1개의 자연사박물관이 있다.
각각의 자연사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생물표본의 수도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과 프랑스 파리 자연사박물관은 각각 8000만 점과 7000만 점의 생물 표본을 소장하고 있다.
○ 한국 생물자원 다수 해외에 보관돼
그동안 한국은 생물자원 관리에 소홀해 국내 고유종의 ‘기준표본’조차 다수가 외국의 자연사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상태다. 기준표본이란 종을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본으로 해당 생물자원을 처음 발견한 학자가 특징을 기재하고 학명을 붙인 것이다.
그동안 생물 표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시설이 국내에 없다 보니 한국 학자가 발견한 신종 생물자원의 기준표본이 해외 자연사박물관에 기증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유태철 고등식물연구과장은 “19, 20세기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학자와 선교사들이 한국의 자생 생물을 많이 가져갔다”며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장악한 미스킴라일락을 비롯해 원추리 구상나무 등은 개량돼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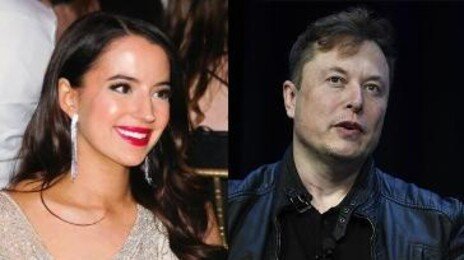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