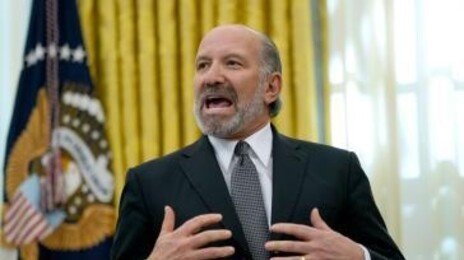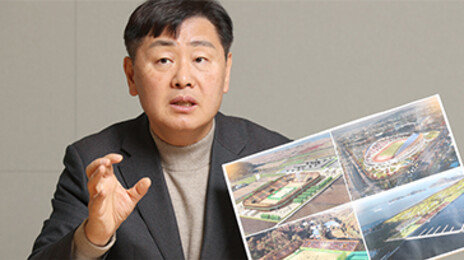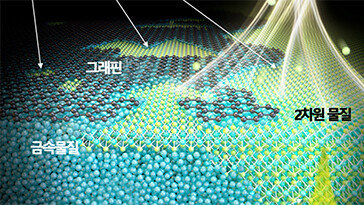법학적성시험(LEET)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논술 시험에 대비해 남은 기간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는 읽기보다 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논술 시험은 글을 쓰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글쓰기 훈련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시험을 앞둔 지금 새로운 지식을 입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히 체화되지 않은 정보는 글의 내용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섣불리 써먹으려고 하다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읽기도 계속해야 하지만 비판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독해 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글을 써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 세트를 써보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한 문항이라도 써 보아야 합니다. 글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쓸 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연습 문제나 대입 논술 문제 중 적절한 것을 골라 써 보면 됩니다.
실전 연습을 한답시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실제 고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써보는 것이 좋지만 이때를 제외하곤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최선의 글을 써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8월 초부터는 시험시간에 맞춰 글을 쓰면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쓴 다음에는 평가를 받아보고 이를 반영해 다시 한 번 써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 계속 글을 쓰고 스스로 고쳐 나가면 논술 실력이 향상됩니다. 마지막 시점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 점검해 보면 더 좋습니다. 지도교수나 친분이 있는 교수 몇 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적절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친구나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같은 문항으로 글을 써서 돌려 읽고 토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현장에 철저하게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8월 초부터는 예비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150분 동안 세 문항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글을 완성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논술은 시간 게임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답안을 작성할 시간대에 맞춰 매일 글을 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논술 고사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실시됩니다. 더운 여름이어서 점심 식사 직후 나른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쓰기는 사고 활동에 기반한 언어 활동이라서 매일 밤늦게 글을 쓰다가 갑자기 오후에 쓰려면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필기구도 현장에서 사용할 것을 정하여 같은 종류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부호 사용법을 확인하여 연습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종합형 문항은 자신의 관점이 투영될 수 없지만 논증 평가형이나 적용 발전형 문항에서는 나름의 관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 시험의 논증 평가형 문항은 거의 제시문에 의존하는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제시문을 활용하되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적용 발전형 문항에는 어떤 쟁점이 출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분명하면 어떤 쟁점이 나오건 나름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능 열쇠를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양한 쟁점과 관련된 이론적 지형을 정리해야 자신의 관점이 생깁니다. 어떤 쟁점이 제기되는 배경을 이해한 다음 그 쟁점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지, 각 관점이나 입장의 핵심 주장과 핵심 논거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정적이지만 자신은 어떤 관점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정해 봄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최대한 명료히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정하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의사소통교육연구실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