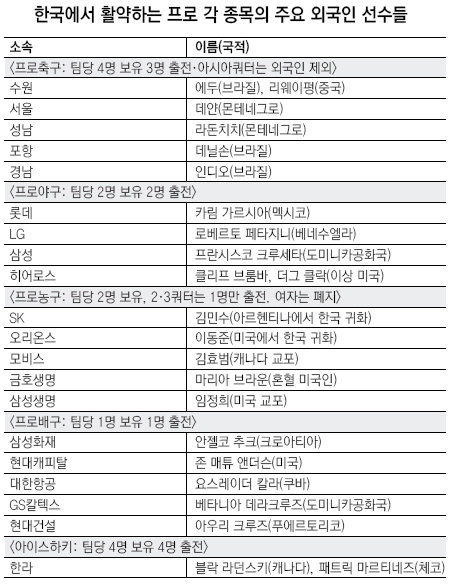
외국에서 생활하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 및 혼혈 선수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낯선 음식과 언어, 그리고 문화까지. 그들은 경기에서 잘하는 것만큼이나 경기 외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르헨티나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2002년 처음 한국을 찾은 프로농구 SK의 김민수(27)도 그랬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배고파요’ ‘안녕하세요’라는 말밖에 몰랐어요. 대화가 안 되니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현재는 구단에서 통역을 제공해 한결 편해졌다. 그러나 항상 통역과 함께 생활할 수는 없는 일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2006년 귀화한 오리온스 이동준(미국명 대니얼 산드린·29)도 언어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특히 존댓말이 가장 어려워요. 후배에게 존댓말을 했다 뒤늦게 후회한 경우도 있죠.”
한국 문화도 아직 낯설다. 이동준은 “한국 선수들끼리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어 생소했다”고 말했다. 김민수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불쑥 영어로 질문했을 때 난감했다”면서 “나는 스페인어는 하지만 영어는 거의 모른다”며 웃었다. 이들은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지만 간혹 차별을 느낄 때가 있다고도 했다.
김민수는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 면허증을 못 땄다. 한국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한국 면허시험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는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스페인어 시험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백인계보다 흑인계 외국인을 더 차별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숙식도 문제다. 주로 합숙을 하는 탓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동준은 서양식이 그리울 때면 구단이 지급한 패밀리 레스토랑 카드로 외식을 한다.
이동준은 내년 시즌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친형 에릭 산드린(31·삼성)과 함께 생활할 예정이다.
“형이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옆에서 한국어와 한국식 예절을 알려줘야죠.”
한국 속 외국인 선수들은 이처럼 언어와 문화의 이질감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문화찾기 >
-

광화문에서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문화찾기]「비평」은 명작을 낳는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