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학교는 과거 ‘문제아 학교’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영국의 써머힐 스쿨(Summerhill School)이나 미국의 알바니 프리스쿨(Albany Free School) 일본의 기노쿠니학교 등 자유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들을 역할모델 삼아 새롭게 탈바꿈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한국교육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과거의 대안학교들은 근대주의 학교의 변형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이 컸던 반면 최근 10여 년간 등장하고 있는 학교들은 탈 근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라며 “우리교육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실험적인 학교”라고 말했다. 또 “과거 대안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대안학교의 성장에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점차 오해가 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6년 경남 산청의 ‘간디학교’를 시작으로 올 해까지 개교한 대안학교는 전국에 100곳이며 설립자의 자유교육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설립주체로 만들어진 학교도 상당수다.
학교들 대부분이 비인가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 하지만 그만큼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파주자유학교 조경숙 교장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아이, 자연스러운 아이, 자립적인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학교 철학의 핵심이자 목표”라면 “공교육을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교육의 현장에 끊임없이 실험하며 적용해 나가는 것이 대안학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안학교는 기숙형 학교와 집에서 등하교하는 도시형 대안학교가 있지만, 예체능 수업비중이 높고 생태 인권 농사 재봉 요리 여행 등 다양한 체험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다. 또 학급당 인원이 평균 10명 내외여서 아이들 개별 특성에 맞춘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강점 중의 강점이다.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낸 추진숙 씨(44)는 “학교에 아이들 수가 적으면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학교가 작다보니 오히려 나이를 초월해 위아래 형 아우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성 훈련이 오히려 더 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안학교들은 보통 10월부터 입학전형이 시작되며 대안교육연대 홈페이지(www.psae.or.kr) 등에서 각 학교에 대한 정보와 전형일자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안교육 지원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에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아닷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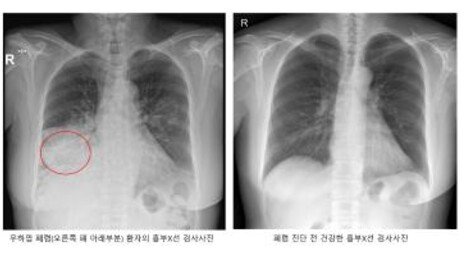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