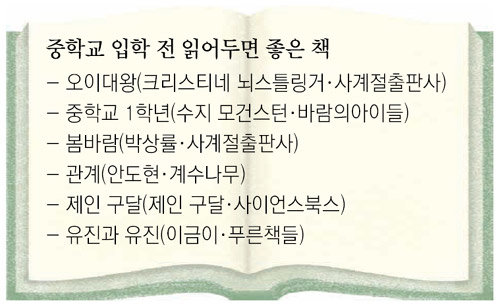
매일 지나가는 길, 수없이 건너갔던 횡단보도에도 수학이 들어 있다. 집 앞 큰길에 있는 녹색 신호등은 몇 초 동안 켜져 있을까?
○ 신호등 녹색 불의 시간
녹색불이 깜빡이는 시간은 횡단보도의 길이를 걷는 속도로 나눈 값과 같다. 도시의 일반도로는 한 차선의 폭이 3m이므로 6차로라면 전체 도로 폭은 약 18m다. 성인이 걷는 속도는 평균 초속 1m이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필요한 시간은 18초라는 값이 나온다. 여기에 4∼7초의 여유시간을 덧붙이는데 이것이 바로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뀐 다음 불이 깜빡이기 전까지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다. 이 때문에 녹색불이 깜빡인 뒤에 횡단보도에 들어서면 정상 걸음으로는 건너기 힘들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지역적 특성이 다른 곳은 녹색불의 시간을 늘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이나 노약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걷는 속도를 평균 초속 0.8m로 낮춰 계산한다. 최근에는 신호등 옆에 녹색불의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함께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숫자나 8개 이상의 역삼각형 도형을 세로로 배열해 남은 시간을 표시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소리로 신호를 알려 주는 음향신호기는 일반인이 길을 건널 때도 긴장감을 불어넣어 안전에 도움이 된다.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빨간불로 바뀐 뒤 차량의 녹색불이 2, 3초 있다가 켜지게 하는 것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8월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이 개장했다. 처음에 광장은 차도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졌을 뿐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었다. 개장 다음 날 택시가 광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높이 25cm짜리 ‘경계석’ 670개로 광장과 차도를 구분했다. 10월 60cm 높이의 돌화분을 설치했다.
이처럼 경계석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다. 차가 인도에 침범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인도의 높이는 경계석의 높이에 따라 자연스레 결정된다.
흔히 ‘도로턱’이라고 불리는 경계석은 높이 20∼30cm, 길이 1m짜리 화강암이나 콘크리트로 만든다. 경계석을 설치할 때 땅에 5cm를 묻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이는 경계석의 높이는 15∼25cm다.
경계석의 높이는 주로 해당 도로를 달리는 차의 속도와 관련이 깊다. 법이 정한 표준 높이는 15cm지만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일수록 경계석을 25cm까지 높인다. ‘자동차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경계석이 높을수록 좋지 않을까’하는 궁금함이 생긴다. 하지만 15∼25cm 높이라 해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자동차가 부딪치면 타이어가 터지거나 튕겨 올라 자동차가 뒤집히기도 한다.
▶지난 기사와 자세한 설명은 이지수학(www.easysuhak.com)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