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안계시면 오라이~ 쑥쓰럽네요”

“어머, 이 언니 이름 나랑 비슷하네? 오호호! 전 안내양 ‘숙’입니다.”
“이런 인연이 있을까… 난 안내양 ‘순’”
김경순 씨(54·서울 노원구 상계동)와 김경숙 씨(50·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만나자마자 서로를 반겼다. 모습도 닮았고 이름도 한 끝 차이다. 결정적인 공통점 한 가지가 더 있었다. 30여 년 전 10대 시절 ‘안내양’이라 불리던 ‘버스 차장’을 했다는 사실. 까마득한 세월을 뒤로한 채 바쁘게 살아온 이들이 22일 오전 ‘1일 안내양’이 돼 30여 년 만에 버스 뒷문으로 ‘출근’한다. 이들은 예행연습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공영차고지에 모였다. “옛날처럼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다가도 “(행사 당일 입을) 버스 안내양 유니폼이 왜 이렇게 촌스럽냐”며 호통치는 이들. 두 사람의 얼굴엔 기대감이 넘쳐흘렀다.
○ 30년 만의 “안 계시면 오라이∼”
그러던 중 “1970, 80년대에 활동했던 ‘전직’ 버스 안내양을 등장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다. 시는 캠페인 행사장인 종로2가를 지나는 버스 노선 20개의 해당 회사에 협조를 구해 전직 버스 안내양을 섭외했다. 그중 두 김 씨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공성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노선팀장은 “나머지 버스 18개 노선에는 버스 기사 아내를 22일 열리는 6월 행사에 ‘명예 안내양’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확히 32년 만에 버스 안내양이 되는 김경숙 씨. 그는 버스와 남다른 인연이 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당시 53번 버스(현 262번) 안내양이었던 그는 같은 회사 버스 정비사와 결혼했다. 이후 ‘여성 버스 운전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운전면허를 따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버스 운전대(2211번)를 잡고 있다. 그는 “안내양 시절 버스 타겠다고 힘들게 뛰는 학생들이 딱했다”며 “버스 운전을 하는 지금도 그런 학생들을 보면 ‘내 새끼’ 같아 중간에 버스를 세운다”고 말했다. 그가 이번에 타는 버스는 중랑∼여의도를 오가는 262번. 과거 안내양으로 활동했던 버스다.
○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도 ‘복고’
160번(도봉산∼온수동)에서 1일 안내양이 되는 김경순 씨는 1971년부터 1978년까지 경기 포천∼연천 전곡리를 다니던 시외버스에서 안내양으로 활동했다.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자 그는 “버스에서 내리던 군인들이 차비와 함께 꼬깃꼬깃 접은 ‘데이트 신청’ 쪽지를 주고 갔을 때”라며 웃었다. 그는 “반나절 이상 버스 안에서 미혼 남(버스 운전사)녀(안내양)가 함께 있다 보니 ‘버스 운전사-안내양’ 커플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남편도 버스 운전사(160번)다.
30년 만에 안내양으로 컴백하는 ‘왕 언니’들은 입을 맞춘 듯 한목소리로 외쳤다. “‘내리실 분 안 계시면 오라이∼’라고 목청 높여 외쳐야죠. 아, 버스 뒷문 옆 ‘탕탕’ 치는 것도요!”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수도권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프리미엄뷰
구독
-

정미경의 이런영어 저런미국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수도권/메트로 파일]잠원동 반포한양 559채로 재건축 外](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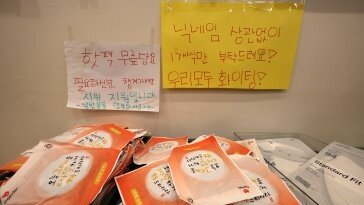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