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입양원서 아이 안던 스님의 눈물…

몇 달 전 스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계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새해 벽두에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스님은 평생 공부에 매진하셨던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학승이시다. 그런데도 스님은 총무원장으로서, 행정 부분의 어려운 많은 일을 아주 합리적으로 처리하신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관 스님은 학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 원로였다. 또한 스님은 우리 중생이 지쳤을 때 기대고 싶은 인자하고 편안한 큰 나무와 같은 분이셨다. 혼탁한 세상에 조금 더 머물며 우둔한 중생에게 밝은 빛을 더 비추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스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2006년 4월 27일 지관 스님께서 가톨릭 입양시설인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하셨을 때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정진석 추기경과 지관 스님의 첫 만남을 “가톨릭, 불교 큰 어른들의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지관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 시설을 방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가톨릭 복지시설을 방문한 것이다.
학문에 대한 관심과 조용한 성품, 그리고 연배도 비슷해서였을까. 정 추기경과 지관 스님은 첫 만남인데도 마치 오랜 벗처럼 자연스러웠다. 겸손함이 평생 몸에 밴 스님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스님께서 “부처님 마음은 어린이 마음”이라고 하신 말씀은 오랫동안 화두처럼 기억에서 맴돌았다. 얼마나 오래 신으셨는지, 바닥이 닳은 스님의 고무신은 그분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날 두 분은 영아실로 자리를 옮겨 아기들을 가슴으로 안아주었다. 스님의 환한 미소의 향기가 방 전체에 은은하게 퍼졌다. 스님은 감격한 듯 눈에 이슬이 맺혀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고 봉사자들을 격려하셨다.
그리고 스님을 두 번째 뵌 것은 같은 해 몇 달 뒤였다. 12월 21일 정 추기경이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시설인 승가원을 답방하셨을 때다. 정 추기경은 지관 스님의 손을 잡고 “8개월여 만에 스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 오랜 지기처럼 친밀감이 느껴진다”고 반갑게 인사하셨다. 지관 스님도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맞아 추기경께서 승가원을 방문해 준 것은 마치 산타할아버지가 온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예수님과 부처님의 사랑은 역시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덕담을 하셨다.
그리고 몇 해 뒤인 2009년 2월 17일 지관 스님께서 명동성당을 찾으셨다. 전날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을 조문하기 위해서였다. 김 추기경님과 생전에 여러 번 만났던 지관 스님은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고통 받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해오셨다”며 선종을 아쉬워했다. 지관 스님은 두 추기경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셈이다.
지관 스님은 생전에 구치소 등 사회의 그늘진 곳을 자주 방문하셨다. 사형수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열고 사형수 5명에게 일일이 법명을 지어줘 그들이 스님의 수계 제자가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지관 스님이 한 일간지와 나눈 대담이 유언처럼 큰 울림으로 남는다. “사실 희망은 정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도 없고 정체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희망은 잘 손짓해서 부르는 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희망하는 마음을 갖고 만족하고, 산 너머 있는 노을을 바라보듯이 늘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스승, 지관 스님의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벌써 그리워진다.
허영엽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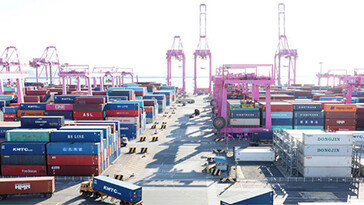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