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만원 단칸방서 거주… 이웃들 “생활고로 파지 수집”장례기간중 집에도 안들러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고문했던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74·사진)은 김 고문이 타계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발인날인 3일까지 끝내 빈소를 찾지 않았다. 경기지방경찰청 공안분실장을 지낸 이 전 경감은 1985년 김 고문이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김 고문을 잔인하게 고문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게 만든 인물이다. 김 고문이 파킨슨병에 걸린 것도 고문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전 경감이 김 고문에게 마지막 사죄를 하기 위해 빈소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이 전 경감을 만나기 위해 장례기간 5일 내내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그의 집 앞을 지키며 주변 지인들을 취재한 결과 이 전 경감은 김 고문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4개월 전부터 연락을 끊었고 성탄절 전후로는 아예 종적을 감췄다. 이 전 경감이 2008년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신학공부를 했던 합동개혁총회신학 정서영 총장은 “6개월 전까지 통화했는데 얼마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전했다. 그가 주로 갔다던 목욕탕 주인도 “한 달 전부터 이 씨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인들은 “이 전 경감 부부는 파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해부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는 13.2m²(약 4평)짜리 허름한 단칸방에 살고 있었다.
한 파지수거업체 주인은 “매주 이 전 경감의 부인 신모 씨가 파지나 알루미늄 캔을 모아와 한 달 평균 10만 원가량의 돈을 받아갔는데 파지 양이 많을 때는 이 씨가 직접 손수레를 끌고 왔다”며 “신 씨가 인근 빌딩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휴지통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Tech&
구독
-

소소칼럼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코로나 격리에 업무 늘어난 집배원… 우편물 1만6000통 버려 징역형 집유[휴지통]](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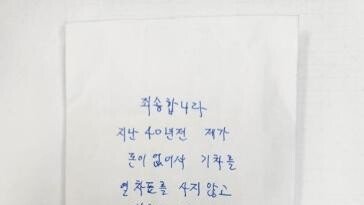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