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료 절반, 성과급으로 지급… 연구원 400명은 원장보다 연봉 많아

햇살이 따사로웠던 13일 오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민봉기 선임연구원은 휴게실 앞을 지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나타난 모니터 화면을 보며 “햇살이 사실은 다 노이즈”라며 “오히려 빛이 없는 야간에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화면에 나타난 건 ETRI가 개발한 ‘3차원(3D) 레이저 레이더’가 만들어낸 영상이었다. 작은 레이저 송신기가 무수히 많은 레이저 광선을 정면으로 발사한 뒤 반사되는 레이저를 측정해 사물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기계다.
이 기계는 미군이 군사용으로 쓰기 위해 개발됐는데 시야가 제한된 탱크나 헬리콥터에서 조종사가 외부 사물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쓴다. 일반 레이더와 달리 세부 형태까지 살필 수 있어 레이더에 잡힌 물체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실시간으로 자동 판단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구글이 개발한 자동운전 무인자동차에 쓰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군사용이라 기술의 해외 이전이 금지됐다.
○ 국산화로 이룬 ‘기술 한국’
ETRI는 이처럼 해외의 첨단 기술을 국산화하거나 새로 개발하며 한국의 정보통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밑거름 역할을 해 왔다. 초고속이동통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편화된 배경에는 ETRI가 만든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통신기술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적 반도체 회사가 출현한 것도 1982년 ETRI가 첫 메모리반도체 제작에 성공하면서 가능했다.
ETRI는 15일 열리는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는다. 이에 앞서 ETRI는 미국특허정보컨설팅 업체 IPIQ의 ‘2012년도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IPIQ는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세계 각국의 연구소와 대학 등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는데 ETRI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과 연구소를 모두 제쳤다. IPIQ 평가는 단순히 특허 출원 건수가 아닌 ‘산업영향력’이나 ‘혁신 주기’ 같은 특허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대덕연구단지라는 좋은 거주환경 덕분에 ETRI 자체가 인기 있는 직장이 됐다. ETRI에는 김흥남 원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400명이 넘는다. 김 원장은 차관급 공무원의 연봉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1억2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ETRI의 전체 직원은 행정직을 포함해 약 2300명이다.
○ 산업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라
ETRI는 급여 외에도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연구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하나는 기술 이전료의 절반을 연구원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ETRI는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면서 기술 이전료를 받는데 이를 연구원에게 일종의 성과급으로 준다. 상품 가치가 높은 기술을 개발하면 한 번에 억대 인센티브를 받기도 한다. 이 제도는 연구원들이 기업이 진짜로 원하는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하게 한다. 연구소에서만 개발됐다가 사장되고 마는 기술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성공 확률이 낮은 연구에 대해서는 ETRI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제도도 운영한다. 실패 확률이 높은 연구에도 연구원들이 도전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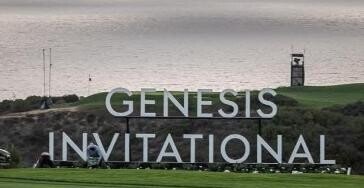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