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신문-방송사들 관훈클럽 세미나
“침몰장면 되풀이 국민들께 충격… 발표 검증 제대로 못해 불신 낳아”
“특종 욕심 때문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기자정신과 직업적 민폐는 종이 한 장 차이였다.”“정부의 발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유족들에게 상처를 준 나도 가해자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관훈클럽이 주최한 세미나 ‘재난보도의 현주소와 과제’는 세월호 참사를 보도했던 기자들이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드는 자리였다.
방 부장은 그 원인으로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살 수도 있었던 생명들(대부분 학생)이 숨져 안타까움과 분노가 컸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모든 언론 보도가 검증 대상이 됐으며 △정부의 잘못된 발표 내용을 언론이 그대로 전달해 불신을 자초했고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의 부재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방송사들은 세월호가 서서히 가라앉는 장면을 쉴 새 없이 보여줬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심리적 충격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후회했다.
“현장 취재기자들이 어리다 보니 피해자들을 배려하기보다 서울에 있는 데스크의 지시를 따르기 급급했다.”(박기용 한겨레신문 기자)
“유족들에게 왜 언론을 불신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보도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받아들고 울고 불며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우리 모습만 보도하느냐’고 반문했다.”(박소영 한국일보 기자)
방청석에서는 “왜 대형 사고가 났는데 경험이 없는 신참 기자들만 현장에 갔느냐” “재난보도 준칙이 있음에도 왜 재난보도는 나아지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기자들은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박만원 매일경제 지방팀장은 “현장에 취재진이 수백 명 몰려와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였다. 이들이 무제한 취재 경쟁에 돌입했을 때 결과는 뻔하다”며 “앞으로는 재난지역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협의체를 꾸려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연합뉴스 사진부 기자는 “배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취재하다 바다에 빠질 뻔했다. 재난 취재 장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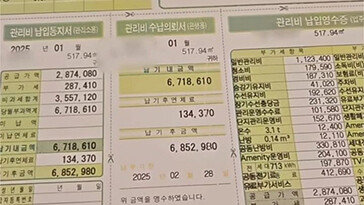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