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3월의 주제는 ‘정직’]<46>지하철 유실물 10%만 주인 품에

“지하철 선반에 선물이 든 쇼핑백을 놓고 내렸는데 유실물센터에 없더라고요. 누군가 가져간 것이겠죠.”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 있는 지하철 3, 4호선 유실물센터에는 물건을 두고 내렸다는 전화가 하루 평균 100건 정도 걸려 온다. 하지만 이 중 실제 물건을 찾는 경우는 10건 정도로 약 10%에 불과하다.
최근 김모 씨(38)는 4호선 지하철 안에서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했다. 퇴근길 4호선 수유역에서 내린 김 씨는 열차 문이 닫히자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크린도어를 두드렸고 승객들이 쳐다보자 손가락으로 선반 위를 가리켰다. 김 씨는 ‘보는 사람이 많았으니 정직한 누군가가 분실물을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했다. 보는 눈이 많아서 오히려 안도했다. 그러나 누구도 김 씨의 물건을 역무실이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다. 열차가 종착역인 당고개역에 도착할 때쯤 역무실에 전화를 건 김 씨는 역무실 근무자에게 가방을 찾지 못했다는 대답만 들었다. 심지어 누군가가 분실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가방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동안 큰 불쾌감을 느꼈다.
서울지하철은 분실물 회수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 누군가 가져가지 않는 이상 분실물이 저절로 증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하철 분실물은 주인이 열차 의자나 선반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가 대부분. 종착역 근무자가 전부 회수해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보관한다. 자신이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는 것만 기억하면 유실물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분실물이 역무실로 들어가면 대부분 주인을 찾아간다. 지난해 역무실에 접수된 분실물 총 11만4352건 중에서 9만6010개(83.9%)가 주인을 찾았다. 문제는 상당수 분실물이 역무실에서 챙기기 전에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한 공익근무요원은 “역무실을 찾아 분실물을 찾아달라고 하는 승객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종착역에서 물건을 찾으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하철 분실물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주인을 찾아가므로 떨어진 물건이라도 가져가면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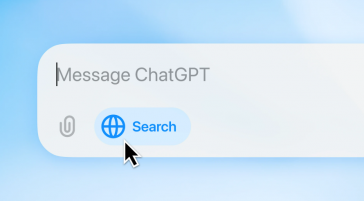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