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4월의 주제는 ‘안전’]<69>횡단보도 보행습관 바꾸자

13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 흥인지문 사거리 왕복 6차로 도로. 횡단보도에 빨간신호등이 들어오기 직전 배낭을 멘 30대 남성이 급히 찻길로 뛰어들었다. 이 남성이 중앙선을 지나려던 순간 옆이 반쯤 열린 가방에서 휴대전화 충전기와 수첩이 쏟아졌다. 떨어진 소지품을 줍는 동안 신호가 바뀌면서 그는 중앙선에 갇힌 신세가 됐다. 이 남성은 교통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며 다음 신호를 기다리다 2분 뒤 길을 건넜다.
흥인지문 사거리는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곳 중 하나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102건의 사고가 발생해 교통지옥으로 손꼽히는 강남역 사거리(100건)를 앞섰다. 이날도 신호를 놓친 뒤 ‘꼬리 물기’를 시도하는 차량과 인근 시장을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뒤섞여 아찔한 순간이 자주 연출됐다.
하지만 그보다 위험해 보인 건 시민들의 횡단보도 보행 습관이었다. 중앙선 위 남성처럼 다음 신호까지 ‘2분’을 기다리지 못한 보행자들은 녹색 점멸 신호에도 도로로 뛰어들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깜빡이는 녹색신호등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보행자 책임도 엄격하게 묻는 추세다. 녹색 신호 점멸 중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적색 신호로 바뀌기 전이라면 10%, 바뀐 뒤에는 20%의 과실 책임을 묻고 있다. 보행자 스스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399명. 이 가운데 220명(55%)이 보행자였다. 같은 횡단보도 사고라도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을 때 인명 피해가 더 크다.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이는 사고의 치사율(5.9%)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보행자를 치었을 때의 치사율(2.9%)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잠시 쉬었다 가는 버릇이 몸에 배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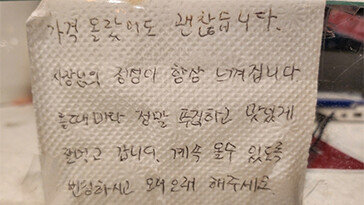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