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성동구 ‘임대료 상생협약’ 조례 제정도
[뜨는 상권 vs 지는 상권] -투자자라면 이렇게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25년간 세탁소를 운영해온 A 씨(60)는 곧 정들었던 동네를 떠난다. 2년 전보다 150%나 오른 월세를 더는 감당하기 힘들어서다. 그는 “옆 가게인 지물포, 앞집인 철물점도 치솟는 월세를 못 버티고 나갔다”며 “찾아오는 젊은이들은 늘었는데 임대료가 비싸지면서 떠나는 주민이 많아 장사는 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탁소를 접고 고향인 전남 신안으로 가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했다.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임대료나 집값이 상승하고,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원주민들이 떠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소위 ‘핫(hot)’한 동네에서 어김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2000년대 이후 서울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홍익대 인근, 가로수길, 삼청동에 이어 최근 뜨고 있는 북촌, 경리단길, 연남동, 성수동까지 해당 지역의 원주민과 상인들이 이 현상을 겪고 있다. 영화 ‘국제시장’으로 유명해진 부산 중구 광복로도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임대료가 폭등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상인들이 대거 떠나는 일이 생겼다.
서울 성동구는 올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자율상생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다. 갑자기 임대료를 두 배 이상으로 올리는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건물주, 임차인, 거주자는 물론이고 사회적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도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었다.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존 주민이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권리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기존 상인들을 내쫓는 악덕 건물주들을 제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입자권리운동을 펼치고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임영희 사무국장은 “열심히 일해 상권을 만들어 놓으면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해 졸지에 가게를 잃는 상인이 여전히 많다”며 “영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외에 건물주의 횡포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영국의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된 말. 저소득 노동자들이 살던 낙후 지역에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유입되면서 지역사회의 성격이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했다. 요즘에는 도심이 개발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자영업자 등이 지역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토요판 커버스토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김영민의 본다는 것은
구독
-

e글e글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토요판 커버스토리]하늘로 번지는 ‘남중국해 갈등’](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11/14/7477465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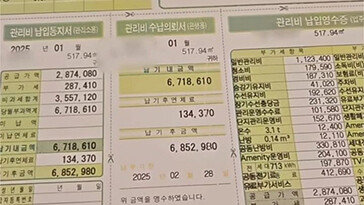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