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켜요 착한운전]안전띠 경고장치 시범버스 타보니

전세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앞좌석 뒷부분에 달린 경고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승용차의 안전띠 경고등 모양의 빨간 불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기사님, 이 깜빡거리는 불 좀 꺼주세요!” 기자의 부탁에 마이크를 든 운전사 강인석 씨(48)는 “안전띠를 매면 불이 꺼집니다, 안전띠를 매주세요”라고 말했다. 빨간 불빛이 거슬려서라도 안전띠를 맬 수밖에 없었다. 안전띠 버클이 채워지자 경고등이 꺼졌다. 그리고 강 씨가 앉은 운전석 왼쪽 창가에 달린 8인치 태블릿PC에서도 기자가 앉은 7번 좌석에 켜져 있던 빨간색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이 장치는 교통안전공단이 7월 말 개발한 안전띠 경고장치(SBR·Seat Belt Reminder)다. 승객이 앉는 좌석 안쪽에 센서를 달아 30kg 이상의 무게로 누르면 감지한다. 안전띠 버클 안에는 안전띠가 채워졌는지 감지하는 센서를 달았다. 사람이 앉았는데도 안전띠가 채워지지 않으면 좌석 앞쪽의 경고등이 깜빡이고 이 신호가 운전석의 태블릿PC로 전달돼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한다. 9월부터 이 장치를 단 버스를 시범운행 중인 강 씨는 “승객 본인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운전자도 경고할 수 있어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맨다”고 말했다.
현재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승객은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운전자는 이를 승객에게 안내해야 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2).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으면 20만 원,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으면 3만 원이 부과되며 횟수가 더해질수록 금액은 커진다.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시범운행 중인 안전띠 경고장치를 내년 중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포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시동 켜요 착한운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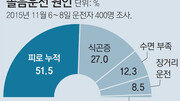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