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도심 제한속도 10km 낮추자]<6>부천여중∼심곡사거리 달려보니
《 1022명. 2014년 한 해 폭 9m 미만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다. 하루 평균 3명이 ‘집 근처 도로’를 걷던 중 참변을 당했다. 물론 보행자의 부주의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조금만 천천히 달렸다면 피해를 줄였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도 적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별도의 감속구간이 아니면 편도 1차로에서 ‘시속 60km’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폭이 같은 도로인데도 제한속도가 들쭉날쭉해 운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곳도 많다.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면도로 속도 정책을 획기적으로 고쳐야 하는 이유다. 》 경기 부천시에 사는 직장인 김혜진 씨(35·여)는 출근길마다 ‘민폐족’이 된다. 서행운전 습관 때문이다. 김 씨의 집 앞 왕복 2차로 도로는 등굣길 학생 등 보행자가 많고 곳곳에 급경사 구간이다. 운전경력 3개월의 김 씨에겐 ‘난코스’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 씨는 가급적 시속 30km를 넘지 않게 운전한다. 이때마다 성질 급한 버스나 화물차 운전사들은 뒤에서 경적을 울리기 일쑤다. 김 씨는 “뒤 차량 눈치가 보여 조금씩 속도를 높이긴 하는데 등교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까 봐 늘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 2km 구간에서 제한속도 6번 널뛰기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김 씨의 운전 습관이 잘못된 걸까. 29일 김 씨의 출근길을 따라가 봤다. 집 앞 부천여중에서 심곡고가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2km 남짓한 도로가 바로 문제의 구간이었다.
도로 구조는 갈수록 위험해졌다. 운행 스케줄에 쫓긴 버스들이 반대편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달렸다. 얼마 가지 않아 횡단보도가 있지만 급커브 구간 바로 뒤에 있어 보행자를 일찍 발견할 수 없었다. 시속 60km로 달릴 때 제동거리(약 35m)를 기준으로 하면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발견해도 지나친 뒤에 정차가 가능한 셈이다. 주민 이원국 씨(58)는 “주위에 학교도 많아 절대 과속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왜 60km로 달리게 허용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잠시 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들어섰지만 구간은 100여 m에 불과했다. 스쿨존이 끝나자 생활도로구역으로 이어졌다. 이곳도 제한속도는 똑같이 30km다. 그러나 ‘스쿨존 해제’ 표지만 있다 보니 대다수 운전자는 감속구간이 끝난 줄 알고 다시 속도를 올렸다. 부천남중학교를 지난 급경사 내리막길에서는 제한속도가 다시 시속 40km로 높아졌다. 이어 좌회전해 진입한 심곡로에선 또 60km까지 올라갔다. 고작 5분 남짓 주행하는 동안 여섯 차례나 제한속도가 바뀐 것이다.
도로를 둘러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높여도 된다’는 신호를 운전자에게 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감속구간의 효과도 떨어질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생활도로와 보호구역이 많은 지역은 제한속도 30km 구간을 도로가 아닌 사각형의 ‘면 단위’로 넓게 지정해 운전자들이 일정 속도를 지키며 달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9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327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30%(98건)가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61.8%(202건)가 횡단 중에 발생했고, 38.2%(125건)는 차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를 친 경우다.
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점차적으로 낮추고 있지만 진행은 더디다. 서울시는 전체 도로의 약 77%가 이면도로인데 이 중 제한속도를 낮춘 곳은 10% 미만이다. 구간마다 일일이 감속 표지를 설치하는 예산도 만만찮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병곤 책임연구원은 “사고를 줄이려면 도로 기능에 따라 속도 제한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도심 제한속도를 도로 폭에 따라 시속 ‘3·5·7(30·50·70km)’ 3단계로 단순화하면 예산도 아끼고 감속 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정성택 기자
공동기획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흐리고 중부엔 비…추위 누그러진 늦가을[날씨]](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67715.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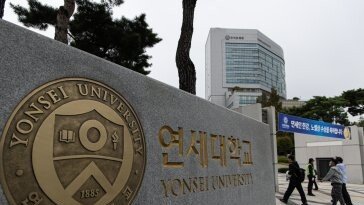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