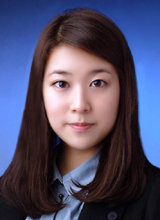
‘늦은 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에서 술 취한 남자가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죽어라 뛰었던 적이 있다. 그때부터 그 골목길을 피해 둘러 갔다.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때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뒤에서 나를 찌른다면….’
‘내 나이 여덟, 아홉 살 무렵 하굣길에 어떤 아저씨가 나를 불러 가까이 세우더니 ‘니 이런 거 봤나’ 하며 열린 바지 지퍼 사이로 본인의 성기를 보여줬다. 난생처음 보는 형체에 뭔지도 모를 막연한 공포를 느끼며 집으로 뛰었다.’
17일 새벽 20대 여성이 강남역 부근 한 노래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의 화장실에서 살해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여자들의 용감한 고백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부끄럽다 생각하고 가슴에 묻고 살았던 개인 경험들입니다. 대한민국 여자라면 누구나 이런 기억 하나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나이 열네 살 때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지방의 조그만 여중은 탈의실이 없었습니다. 저는 체육시간이 끝난 후 항상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바바리맨’은 1층 높은 화단에서 2층 우리 교실을 쳐다보며 하체를 흔들고는 씩 웃었습니다. 기술·가정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아저씨, 너무 작아서 볼 것도 없네요.”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통화하는 척해 본 남자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늦은 새벽 택시 안에서, “어, 아빠(혹은 오빠), 나 택시 탔어”. 택시에서 내려서는 주위를 살피며, “어, 나 집 앞이야. 응? 나 보러 나왔다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연기력에 제가 놀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사리 이런 일을 경험해 왔다는 게 오늘날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과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은 도처에 널려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쉽게 드나드는 공용 화장실, 여름 바람 쐬며 ‘치맥’ 먹으러 가는 한강공원의 폐쇄회로(CC)TV 하나 없는 화장실 말입니다.
전주영 사회부 기자 aimhigh@donga.com
지금 SNS에서는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지금 SNS에서는]숨진 곳으로 기억되는 청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6/03/7847318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