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진에 서쪽 방향으로 5cm 더 벌어진 첨성대 상부(위쪽 부분) 정자석은 19일 여진 이후 다시 북쪽으로 3.8cm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오전에도 규모 3.5의 지진이 일어나 불국사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운동장에서 급식을 먹어야 했다. 여진인지, 더 큰 지진을 예고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액이 75억 원을 넘어야 선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들은 지진 피해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삼국시대 불교국가 신라가 극락정토(불교에서 괴로움이 없고 안락한 세상)를 이승에 지은 종교 도시가 경주였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터키의 이스탄불처럼 종교와 역사가 어우러진 세계문화유산 도시의 찬란한 위엄을 되살리는 복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활 복원도 중요하다. 이번 지진으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경주를 외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경주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단한 땅이, 믿었던 정부가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른다는 공포다. 전쟁이 나는 것처럼 건물이 흔들렸는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피 안내 방송도 없었다.
정밀 단층 조사 없는 경주가 남산 중턱에 쓰러져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하는 마애불(磨崖佛·암벽에 새긴 불상) 신세가 될까 걱정이다. 1340년 전 한반도에 첫 통일왕국을 이룬 신라의 수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경주에서
동아일보 9월 22일자 사설 정리
1. 경주는 과거 어느 나라의 수도였나요?
①조선
②백제
③고려
④신라
①숭례문
②첨성대
③수원화성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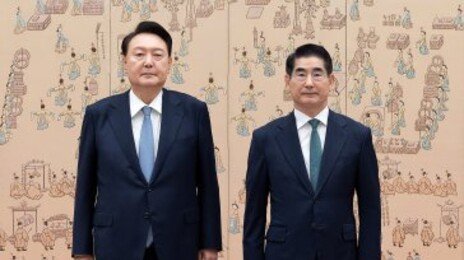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