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볼 기회가 있었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력서는 탄탄하다. 빼곡히 적힌 스펙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채로운 활동들, 마치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밀도 있고, 의미 있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왔어요”라고 외치는 것만 같다. 분명 어딘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실패와 방황, 빈틈은 마치 여백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지워진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에 대비하여 성과가 많은 사람으로 이력서 속 자신을 최적화한다.
사실 나 또한 ‘뭐라도 생산적인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빈 시간이 생기면 부족하다고 느낀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싶어 영어 자막을 틀어 놓고 미국 드라마를 본다거나 뭔가 보람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긴 연휴에는 책을 몇 권 산다. 완전히 풀어져 버릴 때도 있지만 이내 게으른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지난달 한 설문조사에서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9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 세대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생각보다 깊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인생을 모른다”거나 “용기가 없고, 개인주의적”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친구를 기다린다고 두리번거리고, 용기를 내어 다른 길을 찾아 헤매서는 안 된다. 곧장 앞만 보고 직선거리로 달려야 남들보다 앞설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 세대는 더 심하다. 이제는 생활기록부라는 이름으로 학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서조차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 만난 한 중학생은 “우리는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되기 위한 생기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덜 급하고 점수화되지 않을 일이 가장 먼저 저희들의 인생에서 지워집니다”라며 어쩌면 행복은 지워진 일들 속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두리번거릴 자유와 어딘가를 헤맬 용기,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눌 권리, 인생의 여백을 채워 나갈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독하고 강박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최적화된 인생을 사는 세대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우리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옹호팀장
2030세상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상곤의 실록한의학
구독
-

초대석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2030 세상/우지희]기호를 찾으면 인생 즐기는 길 보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10/27/8102512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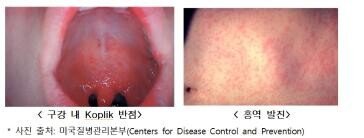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16-10-20 21:56:30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트럼프로부터 잘 사는 나라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요. 외화만 봤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영화도 재미있게 잘 만드는지. 계속 한류도 잘 나가길 바래요. 옛날 어렸을 땐 일제, 미제가 최고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국산만 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