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닭의 문화사]5천년간 인류의 친구… 文 武 勇 仁 信 ‘다섯 가지 德’ 자랑
《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아온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한 병신년. 새해가 이토록 기다려진 적도 별로 없었다. 물론 새해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새 마음, 새 기분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때다.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다. 60갑자 중에서 34번째에 해당한다. 닭은 새 아침과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지금, 희망을 의미하는 닭의 해가 오는 것이 새삼 반갑다. 정(丁)은 적(赤), 즉 붉다는 의미와 통한다. ‘붉다’는 ‘밝다’ ‘총명하다’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총명한 선택으로 새 시대를 시작하는 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현실의 닭은 수난의 연속이다. 벌써 조류인플루엔자(AI)로 2000만 마리 가까운 닭이 비운을 맞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른다.
여론조사 회사인 엠브레인과 함께 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봤다. 20∼50대 남녀 4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닭(병아리 포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귀여움이 36.5%로 가장 많았고, 친밀함이 23.3%로 뒤를 이었다. 닭의 해를 맞아 인간과 가장 가까운 새인 닭의 인문학적 의미와 한국인의 닭 사랑에 대해 알아본다. 》

정유(丁酉)년이 온다. 닭이 온다. 내가 온다.
이른 새벽, 난 눈과 피부로 빛을 흡수한다. 뇌하수체 전엽의 내분비기관인 송과체가 빛에 자극 받아 호르몬을 방출하면 피가 끓어올라 숨을 내쉬어 명관(鳴管)을 한껏 떨고자 하는 욕망을 참을 수 없다.
“시간을 모를 때는 그 소리를 따를 수 있어서/하늘이 밝을 때까지 잠잘 수 있네(不知時能逐聲 想應睡到天明·부지시능축성 상응수도천명)….”(정인홍 ‘내암집’)
울음의 효과
울음소리로 나는 인간의 시간과 귀신의 시간을 나눴다. 내가 울면 도깨비와 귀신들이 물러갔다. 귀신을 쫓을 때 사람들은 내 피를 뿌렸다. 물에 빠진 사람의 시신을 찾지 못했을 때는 나를 물에 던져 내가 우는 곳에 망자의 넋이 있다고 생각했다.
김알지는 내가 울던 나무 밑의 궤 안에서 일어났고 박혁거세의 왕비 알영의 입술이 원래 내 부리와 같았으며 신라의 다른 이름이 계림(鷄林)이니 신라는 나를 모시는 나라다. 고구려도 나를 숭배해 무용총 천장에 내 그림을 남겼다. 신라인들은 고구려군을 공격할 때 외쳤다. “수탉을 죽여라”(‘일본서기’).
오랫동안 나는 고기와 알을 제공하는 존재 이상이었다. 대보름날 꼭두새벽에 내가 열 번 이상 울면 그해는 풍년이 들었다. 결혼식 초례상의 청홍 보자기 안에서 나는 새로운 부부의 인연을 축복했다.
다섯 가지 덕
나를 칭송하라. 나는 십이지(十二支) 중 유일한 조류다. 머리에 관(볏)을 썼고(문·文), 발톱으로 공격하며(무·武), 적을 보면 싸우고(용·勇), 먹을 것을 보면 서로 부르며(인·仁), 어김없이 때를 맞춰 우니(신·信)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자(하달홍 ‘축계설’)가 바로 나다. 조로아스터교의 전승은 “수탉은 악마와 마법사에게 저항하기 위해 창조됐다”고 했다. 페르시아인들은 닭이 나태의 악마인 부시아스타를 물리친다고 믿었다.
조선의 지방관들은 내가 드문 모습(기형)으로 태어나면 조정에 보고했고, 대신들은 왕의 덕을 의심했다. 성종 때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은 민가에 세 발 달린 암탉이 난 게 임금이 불교를 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성종실록 25년 10월 9일자). 성종은 “요괴한 일이 나 때문인지 대신 때문인지 소민(小民) 때문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이 닭을 궁에 들여 직접 본 뒤 끝내 대신들에게 항복했다.
멀고 가까운 조상들
적색야계는 약 5000년 전 동남아시아의 밀림에서 인간의 곁으로 왔다. 오래전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고대인들에 의해 각각 길들여졌다는 연구도 있다.
1911년 어느 새벽, 34세의 생물학자 윌리엄 비비는 미얀마 북부의 축축한 숲에서 적색야계를 목격하고 “햇빛이 깃털의 적색, 녹색, 자색을 비추자 새는 잠시 불타오르는 듯했다” “길들일 수 없는 표범 같았다”고 썼다. 적색야계는 800m 너비의 계곡을 날아서 건너갔다. 이들은 극도로 까다로워 닭장에 가두면 창살 사이로 목을 넣고 스스로 비틀어 죽어버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기원전 13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도자기 조각에 내 그림이 있다. 초기에 인간들은 나를 먹기보다 창자나 뼈를 가지고 점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 미얀마 북부의 카렌족은 도축한 닭의 대퇴골에 대나무 조각을 집어넣고, 그게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보이지 않는 영혼이 머무르는 영역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다. 또 나의 섬세한 뼈는 바느질이나 문신 도구, 작은 악기를 만드는 데 활용됐다.
인류에의 기여
우리 족속의 고기와 알은 곡식을 먹는 인간에게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더구나 나는 돼지나 소와 달리 인간과 먹이를 두고 다투지 않았다. 나는 태국과 인도를 지나 메소포타미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인간은 새로운 땅을 개척할 때 나를 반드시 데려갔다.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군도와 이스터 섬을 향하는 폴리네시아인들의 카누에도 있었다. 지금 우리 족속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서 산다. 인구 성장이 식량 생산능력을 압도할 것이라는 맬서스의 경고가 실현되지 않은 데는 우리의 힘이 컸다.
우리가 알을 매일 낳는 건 자연선택이 아닌 인위선택의 결과다. 인간이 알을 많이 낳는 닭을 계속 선택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다른 새들은 거의 다 일부일처제인 것과 달리 우리 일족이 일부다처제가 된 건 우리가 하늘을 포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3차원 공간에서는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통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땅에서는 힘센 수컷이 다른 수컷들이 암컷들한테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저항정신
올해에는 나에게 권력자의 지능을 빗대지 말라. 조류는 두뇌가 작은 것일 뿐 포유류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어쨌든 우리는 시민들의 저항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2012년 멕시코시티의 달걀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같은 해 이집트 카이로의 시위대는 “저들은 비둘기 고기와 닭고기를 먹고, 우리는 매일 콩만 먹는다”고 외쳤다.
요즘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도살처분으로 우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만약 치명적 AI가 전 세계에 동시 창궐해 우리가 사라진다면 야생 닭을 가금화하는 작업을 수천 년에 걸쳐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인간은 그동안 타조알이나 메추리알을 먹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나는 새로운 시대다. 안도현 시인은 읊었다. “…들꽃들아/그날이 오면 닭 울 때/흰 무명 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서울로 가는 전봉준’ 동아일보 1984년 신춘문예 당선작) 내가 온다. 정유년이 온다.
◇도움말: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이희훈 현대축산뉴스 발행인 ◇참고서적: 책 ‘치킨로드’(앤드루 롤러 지음·책과함께) ◇고전 원문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토요판 커버스토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이럴땐 이렇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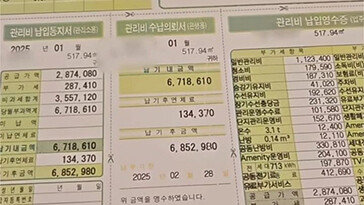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