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로 끝난 자랑스러운 제복
“‘걱정 마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우리 아들이 왜 여기 있죠….”
이 소방사는 이날 오전 4시 29분경 경포 석란정(石蘭亭) 화재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렸다. 이 소방위도 함께였다. 둘은 18분 뒤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을 거뒀다. 소방공무원이 된 지 9개월이 된 이 소방사와 30년 경력으로 내년 말 정년퇴직을 앞둔 이 소방위는 ‘멘티’와 ‘멘토’처럼 묶인 한 조였다.
이 소방사는 해병대 전역 후 뒤늦게 강원도립대 소방환경방재과에 진학해 소방관의 꿈을 키웠다. 그는 평소 주변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했다.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소방관만큼 자랑스러운 직업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가 최근 간식을 양 손에 한가득 든 채 모교를 찾아 “강릉 전체를 책임지는 소방대원이 되겠다”고 말한 까닭이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빈소를 찾은 가족들과 친구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소방사의 고모는 그의 영정 앞에 술잔을 놓으며 “남들 지켜야 한다고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던 조카가 죽어서야 술맛을 본다”며 울먹였다. 광수 씨는 “우리 호현이가 노량진 쪽방에서 독하게 소방관 시험을 준비했는데…그토록 바라던 소방관을 1년도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잉꼬 부부’로 동네에서 소문이 난 이 소방위의 아내는 빈소에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기대 힘겹게 빈소에 앉아 있었다. 재치가 넘쳐 늘 가족을 즐겁게 해주던 남편이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화 한번 내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었다. 갑작스럽게 닥친 비보에 이 소방위의 아내는 남들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었다. 이 소방위의 형 영환 씨(71)는 “금실이 너무 좋은 부부였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6남 2녀 중 일곱째인 이 소방위는 치매증상이 있는 노모(91)를 열심히 보살폈다. 그는 “퇴직하면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매일 뵙는 게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이 소방위는 퇴직 전 공로연수 대상자로 현장근무에서 빠져도 되지만 사이렌이 울릴 때면 앞장서서 출동했다. 동료들은 “최고참인데도 이날 새벽 호출을 받고 가장 먼저 달려갔다. 불 앞에서 늘 앞장서는 선배였다”고 말했다.
한편 두 소방관의 죽음에 동료들은 비통해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이 소방사는 베테랑 이 소방위를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한다. 이 소방위는 이 소방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아들처럼 여기며 가르쳤다. 최상규 경포119안전센터장은 “한 팀을 이뤄 화마와 싸워온 동료를 잃게 돼 너무 안타깝다”며 “강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던 이 소방위와 팀 막내로 센터 분위기를 밝게 만들던 이 소방사가 순직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소방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다. 영결식은 19일 오전 10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강원도청장(葬)으로 거행된다. 영결식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강릉=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강릉=최지선 기자aurinko@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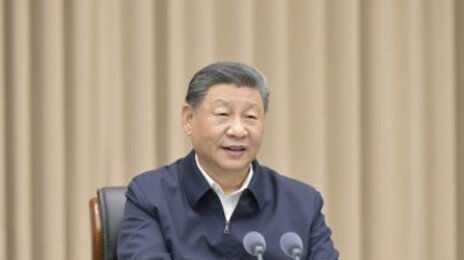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