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박고형준 상임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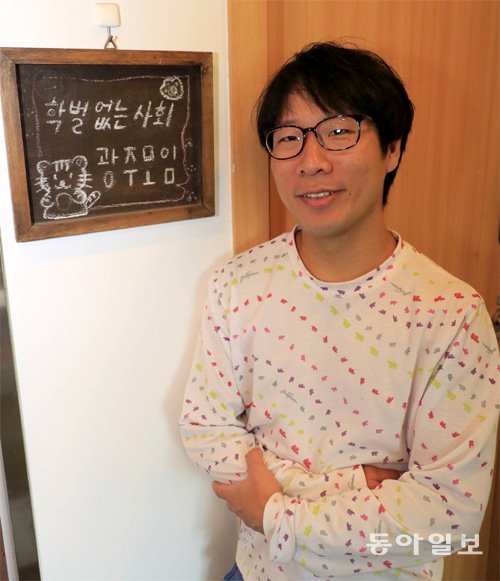
19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5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 씨(33)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등 성차별적이고 입시 과열을 조장하는 문구 업체들의 광고 및 상품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진정서였다.
문구 업체들을 상대로 한 박고형준 씨의 국가인권위 진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5년 문구 업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이 청소년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당시 누리꾼들의 여론이 들끓자 문구업체 B사 대표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B사 등은 이후 여론이 가라앉자 슬그머니 성차별적이고 입시 과열을 조장하는 유사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이날 오후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를 만났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앳된 얼굴이었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 부드러웠다.
○ 학벌 비판 ‘변방의 게릴라’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 표명을 한 경우다. ‘서울대 ○명 합격.’ 대학입시가 끝나면 고교 정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 글귀다. 많은 학생들은 그간 동경과 열등감이 뒤섞인 눈길로 현수막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꾸려지기 이전인 2006년부터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2006년 초 한 술자리에 갔더니 친구들이 현수막이 꼴불견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없애야지. 누가 없애냐’ 그랬더니 다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고교 재학 때부터 반골 기질이 강했던 그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권운동센터 등 관련 시민단체를 설득해 모임을 꾸리고 곧장 등하굣길 현장으로 달려갔다. 논리를 개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며 홍보활동을 했다.
대학 합격 홍보 현수막 게시는 광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까닭에 반향은 컸다. 단체들은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듬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권위는 2012년 11월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특정 학교 합격 홍보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목표했던 인권위 ‘권고’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교육계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2014년 대학 도서관이 지역 주민 등에게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학 도서관 개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보여줬고 일부 대학이 도서관을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계기가 됐다.
그가 올 들어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은 모두 13건. 남도학숙 입사자 성적 차별, 항공사 승무원 학력 차별, 예비군(동원) 훈련에서의 학력 차별,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의 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 모두 학력 차별과 인권 침해에 관한 것들이다. 그가 ‘변방의 게릴라’, ‘워치도그(파수꾼)’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인권의 관점에서 학벌 타파에 접근한 활동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인권소금상,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민주언론상 등을 받았다.
학벌에 대한 반감은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컴퓨터에 관심이 컸던 그는 지역의 한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려 했다. 그러나 학교도, 부모님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로지 명문대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는 그의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결국 인문계 고교에 입학했다.
끌려가다시피 진학한 학교는 ‘입시 사육장’같이 느껴졌다. 학교는 ‘좋은 대학’을 향해 뛰어가야 한다고 강요했다. 0교시 시작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신문배달을 하고 1시간가량 늦게 등교하는 그를 학교는 용납하지 않았다. 여름방학 때는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 보충수업이 그를 가로막았다. 학교 방침을 거부하고 해남 땅끝에서 임진각까지 국토 순례를 떠났다. 국토 순례에서 다른 세상을 만났다. 세상의 전부처럼 보이던 학교 담장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달았다.
2000년 서울에서 ‘중·고등학생연합’이 결성되자 그는 광주지부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집회를 통해 두발자율화를 요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운동도 펼쳤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고 ‘NGO대학’이라 불리는 한 대학에 진학할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200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던 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걸어간 곳은 고사장이 아닌 광주시교육청이었다. 그는 교육청 정문에서 ‘대학 평준화’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학력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수능 전날까지도 고민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곳이 대학이고 학벌의 기득권이 우리 사회를 차별로 이끈다는 생각에 맞서 싸우는 길을 택했죠.”
혼자만의 행복이 목표였다면 대학 진학 거부 같은 일은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매일같이 시험에 쫓겨 사는 학생들, 그 시험제도의 낙오자가 되거나 성적을 비관하며 자살하는 학생들…. 주변에는 치유가 필요한 아픔이 너무 많았다.
그는 특정 집단의 구호나 활동만으로 학벌 사회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벌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같은 구조에 편승하려는 이중성이 결국 사회를 균열시킨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학벌 문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불행한 사회는 차이(다름)를 차별(틀림) 이유로 삼는 사회입니다. 저의 꿈은 학력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차별에 의해 인간다움이 짓밟히는 세상에 앞으로도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