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7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 창문을 통해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불길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소방차는 신고 4분 만에 도착했다. 소방대원들은 14층으로 올라갔다.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했다. 물이 나오지 않았다. 원인을 따질 시간이 없었다. 대원들은 1층 소방차에 호스를 연결했다. 20kg 넘는 장비를 짊어진 대원들은 소방호스를 이중삼중 연결하며 뛰어올랐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아파트에 있던 구모 씨(64)와 아내 나모 씨(63), 구 씨의 어머니 김모 씨(91) 등 3명은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소화전 배관 스위치는 수동으로 돼 있었다. 스위치가 ‘자동’으로 돼 있어야 중앙펌프가 작동해 소화전을 쓸 수 있다. 결국 이날 아파트 건물 11개 동 전체의 소화전 배관은 비어 있었다. 은평소방서 관계자는 “동파를 우려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일시적으로 소화전 스위치를 ‘수동’으로 바꿔 놓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처음에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꿔 ‘현장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견을 소방당국에 전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30일 합동 정밀감식을 진행한다.
각 시도소방본부가 매년 특별점검을 하지만 사전 공지 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 소방청은 지난해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후속 대책 중 하나로 특별점검을 ‘불시단속’으로 바꿨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화전 폐쇄를 신고한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신고제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 대상은 백화점과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화전 사용을 방해한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력하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익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배준우·서형석 기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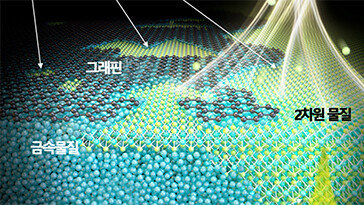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