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성들, 미투 폭로 그후
숨이 가빠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속에서 무언가 차오르듯 목이 답답했다. 옆에 있던 아들이 “엄마, 왜 자꾸 한숨을 쉬어”라고 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여지수 씨는 지난달 26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했다. 폭로 대상은 1997년 제자였던 자신을 성추행한 김석만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67·연극연출가). 당시 30대였던 여 씨는 21년간 고통을 겪다가 겨우 용기를 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자신의 폭로에 달린 댓글을 보고 여 씨는 다시 충격을 받았다. ‘소설 같다’ ‘글 실력 자랑하냐’ 등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셀 수 없었다.
여 씨의 폭로가 있던 날 김 전 교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 씨의 답답한 심경은 풀리지 않았다.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는 김 전 교수의 사과문에서 여 씨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자신의 미투 후 악성 댓글까지 이어지면서 상처가 더욱 깊어졌다. 며칠간 힘겨워하던 여 씨는 그동안 하지 않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여 씨는 “SNS를 통해 그동안 사람들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며 소통하려고 한다. 더 이상 그늘 속에 숨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성추행이 폭로된 배우 최용민 씨(65)가 교수로 있던 명지전문대의 경우 같은 학과 남성 교수 대부분에 대해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교수 사과 등 해결 방식을 놓고 학교 내에서 논란이 일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자 여성 교수와 학생회가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역시 미투에 동참했던 모델 A 씨(23·여)는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일할 때 반드시 사진을 찍고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5일 “사진작가가 반나체 의상을 강요하고 촬영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진작가는 “합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무리한 의상”이라며 분명히 거부했지만 증거가 없어 혼자 속을 태우고 있다. A 씨는 “폭로 글을 5차례나 쓰고 다시 썼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도리어 거짓말쟁이로 몰렸다”고 털어놨다.
피해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미투가 마치 유행처럼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다. 각계에서 용기 있는 폭로가 이어져야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서다. 사진작가 배병우 씨(68)의 성추행을 폭로한 B 씨(29·여)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미투 관련 뉴스를 검색한다. 새로운 폭로가 나오면 주변 사람에게 기사를 보내준다. 한 사람이라도 더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B 씨는 “행동해야 (잘못된 것이) 바뀐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조유라·정현우 기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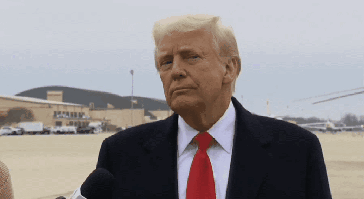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