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청년

장맛비가 쏟아지던 5일.
대구 중구의 한 작은 공방에서 청년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수분 하나 없이 마른 꽃, 포장에 쓰였던 구겨진 종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운명이던 폐품들에 청년들의 손길이 더해지니 세련된 엽서로 재탄생했다. 친환경 제품이 각광받는 시대에 꼭 필요한 ‘업사이클링’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의 모습이다.
대구 청년센터는 실용성과 재미를 갖춘 다양한 학과를 갖춘 청년학교를 3년째 운영중이다. 학교 이름은 ‘딴길’이다. 좋은 대학이나 직장만이 성공이라는 공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경험과 교육을 얻어가라는 뜻이다. 업사이클링 교육을 담당하는 사공영미 대구문화예술 창작공간 대표는 “지난해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 중엔 이 분야에 흥미를 느껴 강사가 되기도 했다”며 “학생들 스스로 재능과 적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보통 지자체 청년센터는 취업알선처럼 ‘청년 일자리’에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런 통념은 청년센터에 대한 벽을 높이고, 외면하게 만든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아리나 교육활동을 지원받으며 자연스럽게 센터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 청년센터에선 청년학교 ‘딴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갭 이어(gap year)’도 지원한다. 갭 이어란 대입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진로 탐색을 위해 갖는 휴식시간을 말한다. 한국 사회에선 이런 선택을 하는 학생들을 찾기 어렵다. 대구 청년센터는 3주간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단기 갭 이어를 장려하고 있다. 청년들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 시에 제안하는 ‘청년ON’ 프로그램도 있다.

문유진 양천 무중력지대 센터장은 “지역사회에 파편화된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며 “센터 이름인 ‘무중력’ 역시 사회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청년으로서 활동해보자는 취지로 지은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 지자체 운영 중인 청년센터 이용해봤나? “없다”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중인 청년센터는 실제 청년들에게 얼마나 가까운 곳일까. 동아일보는 취업포털 인쿠루트와 함께 14~17일 2030세대 청년 346명을 대상으로 ‘청년센터 이용 현황’을 설문조사했다.
구직기회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이 지자체의 청년센터에 무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관심이 없어서’(32.0%) △‘지리적으로 멀어서’(15.8%)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14.3%) △‘어색해서’(11.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주관식 답변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소개받은 적 없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청년들 스스로 찾아오는 청년센터가 되려면 무엇보다 수요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2030청년들이 필요하다고 꼽은 프로그램은 △스터디 공간 제공(14.6%) △멘토-멘티 연결(12.4%) △심리치료(9.8%) △영화제작, 요리실습 등 취미활동 지원(8.2%) △지역청년 커뮤니티 활동(8.1%) 등이었다.
지자체의 청년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A씨는 “심리치료나 멘토 강연은 참여자들 만족도가 무척 높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을 수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센터는 정부가 쏟아내는 수많은 청년정책들을 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목표 배달형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내용이 청년들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센터를 방문하면서 정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정책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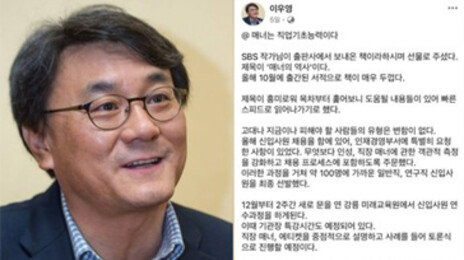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