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차 안에서 사망. 이불에 깔려 질식사.
엄마로서 취재하다 가장 섬뜩할 때는 아이들이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을 접할 때다. 9명에 불과한 아이들을 차에서 내려주면서 한 명을 깜빡한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11개월 아기를 재우겠다며 이불을 덮어 몸으로 누른 담임교사.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이런 소식은 정말 속상하면서도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나도 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 아이들은 언젠가 부모 손을 떠난다지만 워킹맘들은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어떤 분들에겐 더 짧은 기간일 테지만) 만에 아이를 손에서 떠나보내야 한다.
어느 날인가 오후 출근을 하는 날이라 느지막이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내 막내 어린이집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막내 울음소리가 들렸다. 별일 아닐 텐데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한동안 어린이집 앞에서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어디 다쳤나? 친구랑 싸웠나?’ 당장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곧 아이 울음소리는 멈췄지만 ‘우리 아이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저렇게 울고 또 아프겠구나’하는 생각에 괜스레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내가 두 살 때의 일이다. 당시엔 어린이집도 없었고 베이비시터 같은 건 형편이 넉넉하던 집이나 들이던 때다. 맞벌이를 하신 부모님은 결국 시골 사시던 엄마의 할머니, 즉 나에겐 증조할머니 되는 분께 손을 벌렸다. 여든이 넘는 노인이 서울까지 올라와 시터 역할을 하신 셈이다. 80세가 가까운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나와 증조할머니는 비교적 잘 어울려 지냈는데,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내가 계단에서 데굴데굴 구르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그냥 구르기만 했으면 좋았을 걸, 처음 넘어지면서 이마를 계단 모서리에 세게 찧었다고 한다. 이마 뼈가 부러지고 피도 상당히 많이 흘렸다.

증조할머니도 혼비백산하셨겠지만 가장 가슴이 철렁했을 건 직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우리 엄마였다. 다행히 당시 일터와 집이 멀지 않아 엄마는 곧장 내가 실려 간 병원으로 내달았단다. 그때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을는지, 나도 같은 워킹맘이 되어보니 상상이 간다. 병원 응급실에서 이마에 피 묻은 붕대를 싸매고 파리하게 누워있는 아기를 마주했을 때 ‘나는 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하고 얼마나 자책감이 드셨을까. 아직도 내 이마에는 뼈 골절자국과 피부 흉이 남아있는데, 말씀은 안 하셔도 엄마에겐 그 못지않은 가슴 속 상처가 남아있을 듯하다.
사고가 난 어린이집 엄마들도 다들 저마다의 사정 때문에 아이를 맡겨야 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혹은 집안을 정돈하는 등 평상시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가 고통 받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그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지. 본인 탓은 아니지만 아마도 평생 ‘나 때문’이란 죄의식 속에 살지 모른다.
평소 다자녀의 장점을 설파하고 다니지만 한편으로 부모 입장에선 자녀가 많다 보니 자녀의 사고를 겪을 확률도 높아졌단 생각도 든다. 아이가 1명인 집에선 아이 다치는 사고가 1년에 1번 난다면 우리 집에서는 1년에 3~4번 날 거라는 뜻이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 1명의 자녀가 다치든 4명 중 1명이 다치든 부모 입장에서 아픔은 똑같다. 과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이들을 큰 탈 없이 온전히 키워낼 수 있을까.
어린이집 사고 뒤 난 다시 한 번 세 아이들에게 안전을 강조했다. “길 건널 때는 반드시 세 발짝 뒤에 서 있다가 파란불이 켜지면 양 옆을 둘러보고 건너기 시작하는 거야.” “아파트 안이라도 절대 뛰면 안돼. 차가 튀어나올 수 있어.” “혹시 차 안에 갇힐 일이 생기면 엉덩이로 운전대 중앙의 경적을 꾹 눌러.” 아무리 귀에 박히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파란불이 켜지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면 쏜살같이 뛰어나간다. 별 수 있나. 매번 호통을 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수밖에.
얼마 전 첫째가 컵으로 장난을 치다가 입 주변에 둥그렇게 피멍이 들고 말았다. 작은 사고지만 마치 턱수염 난 것 같은 얼굴에 내심 속상해 하며 어린이집 등원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자 ‘가능하면 저 피멍이 내 입으로 옮아갔으면’ 싶었다. 평소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인 내게 턱수염 같은 피멍이 있다면 무척 곤란할 텐데도 말이다. 이런 게 부모인가 보다. 아이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질 않길 빌어본다. 여느 노래 가사처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또 다치지 말고.’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구독
-

따만사
구독
-

조영준의 게임인더스트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포(four)에버육아]임신부에게 자리 양보해본 적 있나요](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8/07/9140012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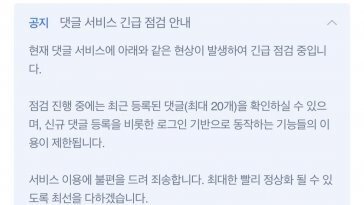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