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4번째 개학 연기 검토에 현장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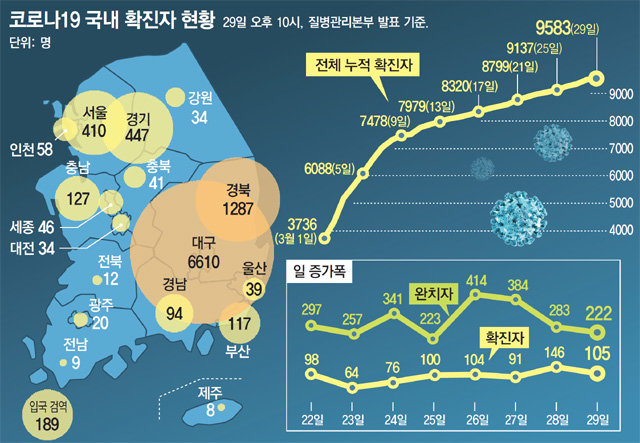
‘1주→ 2주→ 2주→ 이번엔 몇 주 연기?’
정부가 네 번째 개학 연기를 검토하면서 교육계의 우려와 혼란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선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추가 연기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꼼꼼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교육부가 내놓은 긴급돌봄이나 온라인 개학 방안 등에 대해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이나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학부모와 교사가 따르기도 쉽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내용도 부족한 탓이다. 전례 없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온라인 환경 천차만별
경북 포항시의 중2, 초6, 초4 자녀를 둔 학부모 B 씨는 부랴부랴 시판 중인 컴퓨터 가격을 알아보고 있다. B 씨는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막기 위해 집에 컴퓨터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B 씨는 “3월이 다 끝나가는 27일에서야 학교에서 컴퓨터, 태블릿 PC 소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왔다”며 “3명 모두 컴퓨터를 사려면 한 달 월급을 다 써야 한다”고 했다.
○ 땜질식 단기대책 안 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교육 계획안을 여러 경우의 수에 맞춰 제시해 달라는 요구도 높다. 시기별 개학 일정에 따른 지침이 있어야 현장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월 중 개학할 경우 수업 일수는 10% 감축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골고루 줄인다’거나 ‘5월에 개학할 경우 1학기 중간고사는 생략한다’는 식의 지침이 나와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9월 학기제’까지 감안한 종합대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 입시일정 확정도 시급
장기 개학 연기에 가장 불안한 것은 고3 수험생과 학부모다. 입시 일정을 종잡을 수 없어서다. 정치권에서 “고3만 4월 6일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도 이번에는 확정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개학 날짜가 잡히면 수능 날짜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 기존 입시 일정과 방식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시 원서접수 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8월 31일까지 마감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기말고사가 빨라야 7월 말∼8월 초에 끝난다. 온라인 개학이 길어지면 학생부에 적을 내용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세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 재확산 >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김순덕의 도발]‘이재명 리스크’ 민주당은 몰랐단 말인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39561.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