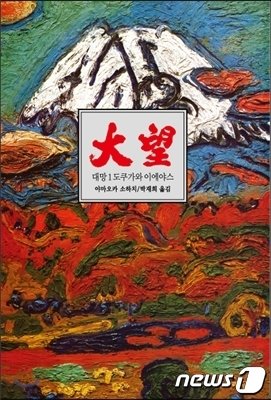
40여년간 일본 전국시대를 담은 소설 ‘대망’을 번역·판매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출판사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출판사 A사 대표 고모씨(79)와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사 창립자 고씨는 일본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67년 집필을 마친 후 현지 출판사 ‘고단샤(講談社)’에서 출판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앞부분을 번역해 1975년 4월부터 ‘전역판 대망 1권’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해왔다.
A사의 경우 1975년판 ‘대망 1권’은 판매가 가능하나, 대폭 수정·증감해서 발행할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런데 다른 출판사인 B사가 원저작물 저작권을 취득한 1999년 이후인 2005년 A사가 ‘대망 1권’의 수정·증감본을 내고, 2016년 3월 1권의 2판 18쇄까지 발행해 회복저작물을 무단복제·배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A씨와 출판사를 기소했다.
1심은 “발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발행부수도 많은 점에 비춰서 저작권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출판사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판사가 2차적 저작물인 1975년판 대망의 이용권한자이고, 2차적 저작물의 번역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을 갖더라도, 2차적 저작물의 이용권한자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용행위를 할 것을 필요로 한다”며 “그런데 2005년판 ‘대망’ 1권은 1975년판 ‘대망’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증감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대표 역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1996년 저작권법 시행으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고씨와 피해를 입은 출판사 사이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5년판 ‘대망’ 1권이 1975년판 ‘대망’ 1권과의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2차적 저작물을 수정·변경하면서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1975년판 ‘대망’ 1권과 비교할 때 2005년판 ‘대망’ 1권은 현대적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번역의 오류를 수정한 부분, 자주 쓰이는 유사한 단어를 단순하게 변경하거나 띄어쓰기를 수정한 부분들이 다수 있으나 양 저작물 사이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봤다.
또 ”1975년판 ‘대망’ 1권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 1권에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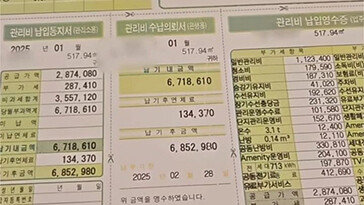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민주당은 어쩌다 ‘더불어펀드당’이 됐나[오늘과 내일/박용]](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26303.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