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놓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적법한 수단이며 사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기본요소인 필요성과 상당성, 비례원칙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일부 기자들을 겨냥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내역을 들여다보는 등 수사권을 동원해 취재원을 색출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통신조회 논란에 “사찰이 아니며 과하지 않은 필요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오히려 “검찰과 경찰도 조회했는데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 하느냐”고 반발하며 “정치쟁점화”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통신자료 조회나 수단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수사대상도 아닌 기자와 가족, 지인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수사에 필요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 처장의 해명만으로는 그들이 왜 공수처의 조회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공범이란 이유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한 수단”이라면서도 “공수처가 광범위한 조회를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타깃을 정하는 사찰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도 일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하진 않는다. 범죄 혐의가 발생한 그 시기에 자주 통화한 사람을 선별해서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일부 기자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통신자료를 조회를 통해 해당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이른바 ‘색출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조회를 당한 것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공수처가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 내역)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TV조선 기자는 지난 4월1일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에스코트해 소환조사했다며 관련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도했다. 또 이 지검장 기소 다음 날 공소장 내용 일부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와 그 가족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서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자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알아내려 했다는 것인데, 이는 취재원 보호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는 “취재원이 아무리 기자를 믿어도 통신영장을 통해 언제 자신이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누가 취재에 응하고 제보를 하겠냐”면서 “과연 법원이 통신영장 청구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기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31일 오전 김 처장과 공수처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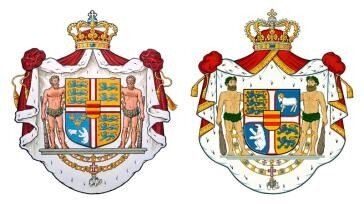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