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내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26명으로 집계됐다. 3주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7619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를 제치고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중환자 병상 부족 위기를 불러왔다면, 오미크론 변이의 상륙은 경증 환자 폭증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에선 앞으로 2, 3주 안에 국내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3대 과제’를 짚어 봤다.
① ‘3만 동네의원’에서 재택치료자 진료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 재택치료자도 함께 늘어난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가 주류가 되는 이달 하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로 늘 것으로 전망한다. 6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가 2만618명인데 이 숫자가 몇 배로 늘어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다음 주 전국 처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 포함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재택치료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늘면 의료진 부담이 줄고 환자들도 제 때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별도 의료진을 채용해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하는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도 대비한다. 이런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② 생활치료센터에서 ‘의심 환자’ 응급 진료
의료 현장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기 전에 응급의료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진다. 지난해 11월, 12월의 ‘응급실 대란’이 재현되는 걸 막자는 취지다.지난번 응급실 대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가며 시작됐다. 이들 모두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음압 격리 병상에 머물렀다. 뇌경색, 중증 외상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들이 사용할 병상은 그만큼 줄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경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그러면 ‘응급실 정체’를 막을 수 있다. 최석재 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기존에 쓰던 생활치료센터나 체육관 등에서 수액 치료 등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기본 진료를 하자”고 말했다.
③ 미접종 고위험군에 먹는 치료제 우선 투여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먹는 치료제다. 질병관리청은 다음주 중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전체 계약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처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백신 접종 여부도 투약 대상자 선정 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남중 서울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맞지 않은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자에 비해 위험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미접종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가장 이득이 큰 집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자칫 백신 접종을 막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선빈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중증 진행을 막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먹는 치료제는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미접종군에게 차선책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먹는 치료제가 백신을 안 맞고 기다릴 때 투여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재확산 >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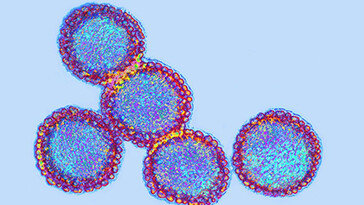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