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진가들은 대체로 겸허합니다. 자신이 원 창작자로 인정받는 사진일지라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사진가는 피사체(사람·사물 포함)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피사체가 뿜거나, 피사체에 반사된 빛을 기계에 기록해 디지털 신호로 저장할 뿐이니까요. 피사체가 벌이는 사건이나 행위, 인위적이거나 우연한 상황은 사진가가 창조하지 못합니다. 사진은 창작자와 기록자가 다른 예술이죠.
때로는 창작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피사체를 만나곤 합니다. 사람과 자연, 물성과 시간이 우연히 얽히고설켜 생성된, 언뜻 보기엔 누군가 만든 것 같은 이미지.
위 사진을 보시죠. 인도 보도블럭과 차도 사이의 길 어깨를 아이폰으로 찍은 것인데요, 도로 공사를 하던 분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노란색 페인트로 화살표를 그렸는데 그 뒤 락카 페인트가 흘러내리면서 둥근 점이 되고, 그게 다시 흘러내리면서 다리 4개가 또렷하게 보이는 뿔사슴 이미지가 창조됐습니다.
이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처음 화살표를 그린 분? 페인트의 점성? 시간? 지구의 중력? 화강암 특유의 질감? 온 우주가 동원된 우연? 제가 발견하고 촬영했으니 원작권(原作權)을 제가 감히 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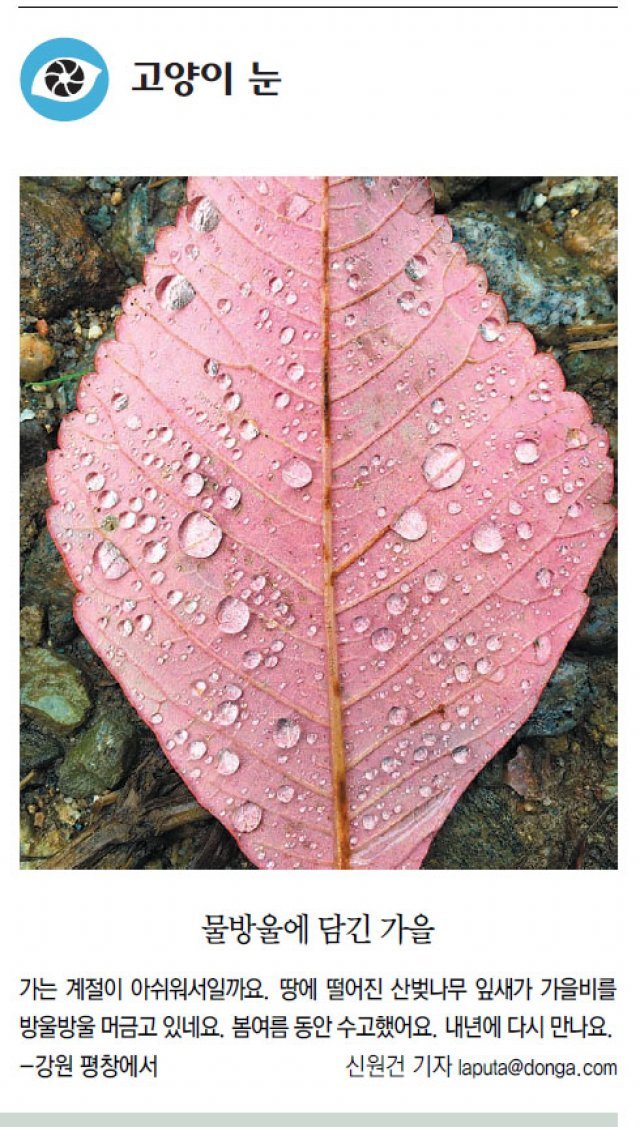
#3 사족
필름으로 촬영하는 작가라면 현상·인화 과정에서 개입할 선택지를 많이 갖습니다. ‘사진’이라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미술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물리·화학 변화가 있다보니 창작 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디지털 사진은 상대적으로 작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약합니다.
고양이 눈썹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인터뷰
구독
-

황형준의 법정모독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비교우위 - 건방진 비둘기를 보며 든 생각 [고양이 눈썹]](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1/17/111254185.3.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