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에 나섰던 한 의료진이 일부 시민의 몰지각한 행동을 비판했다.
3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국립병원 소속 의료진 A 씨가 ‘이태원 현장에서 끔찍했던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전날 밤 이태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하고 도움이 될까 싶어 이태원으로 향했다.
이어 “이미 바닥에 눕혀진 사람들은 얼굴이 질리다 못해 청색증이 와 있는 수준이었다. 응급구조사가 눕힌 사람에게 CPR을 하는데 코피가 나왔다”며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없겠구나 싶었다”고 안타까워했다.
A 씨는 “그 와중 가장 끔찍했던 건 가지 않고 구경하는 구경꾼들”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앰뷸런스에 환자가 실려 간 뒤 잠시 쉬었다가 다시 CPR을 하려고 물 마시는데 지나가는 20대가 ‘아X 홍대 가서 마저 마실까?’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몸서리쳐진다”고 분노했다.
해당 글엔 또 다른 의사 추정 누리꾼의 댓글이 달렸다. 이 누리꾼은 “거기 있다가 바로 (CPR을)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를 느꼈다”며 “시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말했다.
이어 “여태까지 꽤 많은 죽음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충격이 크다. 가망 없는데도 옆에서 친구 좀 살려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여서 그만둘 수가 없었다. 자꾸 떠오른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했다. 이에 A 씨도 “사망한 분 얼굴이 안 잊힌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100명 규모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심리지원 대상자는 유가족과 부상자, 목격자 등 1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심리지원단은 부상자 입원 병원과 분향소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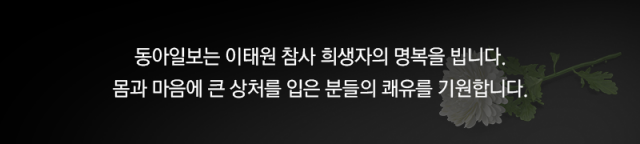
이태원 핼러윈 참사 >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