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Korea is so screwed. Wow!)”
외국인 여성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이 말을 읊는 장면이 하나의 ‘밈(meme)’처럼 인터넷에 돌고 있다. 영상 속 여성은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다. 최근 한 방송사가 방영한 저출산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윌리엄스 교수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 한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라고 한다.
이처럼 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치에, 정작 한국인들은 갈수록 둔감해지는 것 같다. 얼마 전 통계청이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을 0.7명으로 발표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통상 연초 출산율이 높고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우고 사상 최초 0.6명대를 찍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 1명 미만 출산율, 전 세계 전무후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이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한 해 숫자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올 수 있다. 기자는 1980년대생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1981년 출생아 수는 86만7409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23만7481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4배 가까이 더 많았다.
최근 학교에 가보면 이런 현실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기자가 학교에 다닐 때 한 반 학생 수는 적게는 40명, 많게는 50명이었다. 맨 뒷자리 책상에 앉으면 거리도 거리지만 앞에 앉은 애들 머리 때문에 칠판이 잘 보이지 않아 고개를 연방 내뽑아야 했다. 반면 현재 초등학생인 기자의 자녀 학급당 학생 수는 많아야 25명, 적으면 20명이다.
41년이라는 터울이 다소 크다면 최근 10년만으로 한정해 보자. 2012년 출생아 수만 해도 48만4550명이었다. 지난해의 2배다.
● 14년간 215만 명↓…엄마도 줄고 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접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역시 시큰둥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떠한가.출생아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장 당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재생산인력, 즉 향후 아이를 낳을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기간이 정해져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보자.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조사에서 이들 가임기 여성은 2008년 1350만6636명이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 1294만5991명, 2020년에는 1182만4861명 등 12년간 12.5% 줄어든다.
쉽게 말해 아이뿐 아니라 ‘엄마’도 줄고 있는 셈이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저출산의 여파다.
앞으로 엄마는 더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이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이제 그때 태어난 ‘저출산 키즈’들이 점차 엄마의 나이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수치에서도 처음 6년간은 가임기 여성 수가 56만 명 감소했는데, 최근 6년 동안에는 110만 명이 감소해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엄마가 줄고, 남은 엄마들마저 전보다 아이를 덜 낳는다면, 다시 그 다음 세대의 엄마가 줄면서 출생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악순환’이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2008년 당시 1350만 명의 가임군 여성이 그때 출산율(1.19명)로 낳을 수 있는 아이 수와 지난해 가임군 1135만 명이 출산율 0.78명으로 낳을 수 있는 아이 수 간에는 약 1500만 명 이상 차이가 난다.
● ‘저출산 악순환’ 시작…대책 시급
실제 출산율이 1.18명이던 2002년 출생아 수는 49만6911명이었는데, 출산율이 1.3명으로 더 높아진 2012년 출생아 수는 48만4550명으로 더 줄었다. 이런 ‘출산율의 역설’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자연히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적은 것처럼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동기 대비 91개월째 감소 중이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공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19~34세 청년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이는 3명 중 1명 수준(36.4%)으로 10년 전 조사보다 20% 포인트 넘게 줄었다. 2명 중 1명(53.5%)은 결혼해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짐은 물론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종종 온라인으로 유(有)자녀, 다자녀 가구 지원책을 논한 기사를 보다 보면 이런 댓글을 볼 수 있다. ‘아이는 자기들이 낳고 싶어서 낳았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저출산 대책이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 편향된 복지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상황이다. 저출산 대책은 유자녀 가구를 돕기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이런 가구들이 아이를 더 낳아주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국가의 ‘자구책’이다.
지금까지 출생아 수가 8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국가라는 기차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태어난 20만 명이 부모가 되어 0.7명의 아이를 낳는 순간이 되어도 그럴까.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던 기차가 절벽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기차에 탄 사람들은 ‘늘 떨어지고 있었는데 뭘’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이 기차를 멈추거나 최소한 속도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이제 웬만한 대책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정치권과 시민들 모두 상기했으면 한다. 시간이 없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교권 추락은 극성맘 탓?’… ‘교사 vs 부모’ 이슈로 끝나지 않기를[이미지의 포에버 육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9/15/12119610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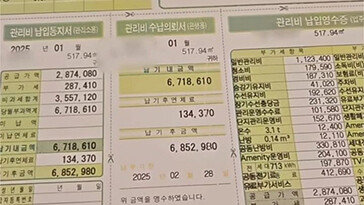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