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어나서 처음 해본 오픈런이 아이 병원 접수예요.”
18일 부산 한 아동병원에서 만난 김모씨(38)는 웃지 못할 씁쓸한 현실을 털어놓았다.
지난 주말 갑자기 열이 오른 5살 아이를 안고 밤새 마음을 졸인 김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소아과 오픈 대기줄을 서는 것이었다.
그는 “오전 6시30분부터 번호표를 배부하고 8시40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접수할 때 현장에 없으면 순번이 그냥 넘어간다”면서 “아빠가 출근 전 번호표를 뽑고 엄마가 아이를 깨워 병원에 오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해운대구의 한 소아과 역시 아침마다 10~20여명 대기줄은 일상이다.
동래구 한 소아과는 현장 접수 없이 ‘똑닥’ 앱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는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의 공백이 가시화되면서 애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응급실 뺑뺑이’ 역시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는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응급실 역시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전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계에 따르면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한 구급차 출동 건수는 1년에 18만여건으로, 하루에 500여건에 달한다.
소방 관계자는 “환자를 구급차에 실어도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소아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도 부족하다. 소방 관계자는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면서 “부산에서 소아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양산까지 가기도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19일 ‘정원 확대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발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부산=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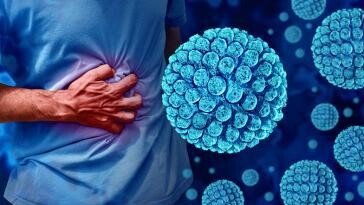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