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결핵환자 2명 살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 이 모 씨(45)가 병원 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숨기려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감염병 환자 입원 사실이 알려지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돼 요양병원 평가에 부정적 평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 부분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씨가 다른 간호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진료 및 처치하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에 환자들이 사망했다”며 “그런 정황으로 보면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의사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유족 등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원장에게 염화칼륨을 건네준 이 병원 행정직원 A 씨(45)도 함께 입건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단순 의료행위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14일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경찰은 당시 병원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이 씨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입원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2015년은 메르스가 유행할 때였다. 코로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그렇게 대우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병사로 처리돼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인에 대한 정확한 판명 없이 장례가 진행됐고 사건이 벌어진 지 8년이나 지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정황상으로는 충분하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의사가 고의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황 증거만으로도 법원이 인정의 폭을 넓혀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또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사가 슬쩍 주사 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비명횡사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유족도 모르는 환자만의 두려움이나 억울함이 심했을 것이기에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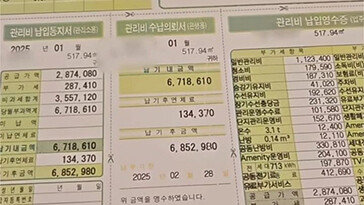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