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한 개인이 청소년기(학업), 청년기(취업 및 출산 양육), 중장년기(은퇴), 노년기(노후) 등 인생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이를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정신건강 관련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하는 것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바꾸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 10년→2년
지금까지는 ‘치료’에 집중됐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예방·조기 발견→치료→재활·일상 회복’이라는 전 과정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대표적인 대책은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고, 중증·만성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판별되면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해 치료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 8만 명에게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에 내년도 예산 539억 원을 책정했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50만~100만 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 환자별 맞춤 관리 계획 수립
퇴원 이후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재활 치료에 참여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 퇴원을 한 환자와 가족 앞에 펼쳐지는 건 ‘치료 절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본보 11월 28일자 A1·10면 참조).
정부는 또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2억 원이었지만 복지부는 내년도에 31억 원을 책정했다.
●“국민 정신건강 관리에 큰 힘 쏟을 것”
정부가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한 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올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처럼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잇달아 범죄를 저지르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책적 뒷받침과 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자문기구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올해 4월 펴낸 보고서에서 “고소득 국가의 경우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1% 정도”라며 “한국의 경제 수준은 고소득 국가에 해당하지만 정신건강 예산 비중은 2.6%(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큰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와 비전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당일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의료계, 정신질환 환자·가족 단체 등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시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이 본인의 경험을 직접 발표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정신과 진료환자, 12년새 2배로… 의사 수는 OECD 절반 미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는 0.8명이다. 관련 통계가 수집된 OECD 29개국 평균인 1.8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29개국 중 한국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0.1명) 콜롬비아(0.2명) 튀르키예(0.6명)뿐이었다.
절대적인 의사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가장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를 진료할 인력이 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국에 5곳 있는 국립정신병원의 전문의 충원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41%에 불과하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전문의 충원율이 38%에 불과했다.
민간 대학병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큰 병원에 남는 것보단 개인병원을 차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까닭에 대학병원을 떠나는 의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연 소득이 2억4000만 원에 이르는 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1억3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시내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은 534곳으로, 5년 전에 비해 77%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중증 정신질환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가 최근 펴낸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1년 안에 자살하는 비율이 0.7%에 이른다. 이는 OECD 평균 0.38% 대비 1.8배에 해당한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국내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4.2배였다. OECD 평균(2.3배)에 비해 83% 높은 수치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단독]美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트럼프측, 한달전 韓에 협업 문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20/130695144.1.jpg)




![백년 전 만평, 사진으로는 담지 못한 진주 시위대의 목소리[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95191.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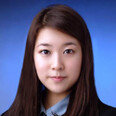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