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 문화권에서 ‘용(龍)’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십이지지(十二地支)의 열두 동물 중 유일하게 현실에 없는 동물이면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용은 고대부터 비를 내리고 바람을 몰고 오는 영물(靈物·신령스러운 동물이나 물건)로 여겨져 농사 깃발에도 용을 그려 넣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상징해 중국 황제와 조선의 왕들은 용이 그려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은 언제, 어떻게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같은 동양에서도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용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내몽골 초원 지대에선 말과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황허강 유역에서는 악어의 형상으로 등장합니다. 고구려 유적인 강서대묘에 그려진 용은 날개가 달린 도마뱀을 닮았습니다.
용의 기원에 대해 많은 가설이 있지만 가장 그럴듯한 건 악어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입니다. 고대 국가인 상나라의 갑골문자나 주나라 초기 주역의 묘사를 보면 대체로 머리에 뿔이 있고 위턱은 길고 아래턱은 짧은, 또 네 개의 짧은 다리가 달린 파충류와 비슷합니다. 고대 중국은 지금과 기후가 달라 코끼리나 코뿔소, 물소 같은 다양한 동물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한나라 이후부터는 용의 모습이 점차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후한(後漢) 말기, 왕부라는 사람은 구사설(九似設)에서 머리는 낙타, 뿔은 사슴, 코는 돼지, 비늘은 물고기, 몸통은 뱀, 발톱은 매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대의 여러 부족들이 받들던 토템이 훗날 한족이란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면서 나온 결과물이란 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상상하는 용의 모습이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화에선 뱀이 500년을 살면 비늘이 돋으면서 이무기가 되고, 그 이무기가 다시 500년 동안 도를 닦아 여의주를 얻으면 뿔과 날개가 돋아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설에는 심지어 지렁이나 조개도 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토룡(土龍)이나 어룡(魚龍)이라는 말도 생긴 게 아닐까 합니다. 중국에서도 오래 묵은 잉어가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등용문’의 고사가 있는 걸 보면 이런 발상은 두 문화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으로 용의 해입니다. 평범한 잉어나 지렁이가 자신의 노력으로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전설처럼, 우리도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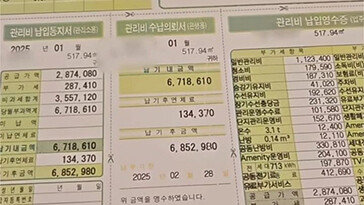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