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로 출입…조사 후 6시간 '귀가 거부'
일선 경찰 "현장선 늘 갈등 소지 있었어"
"유명인 포토라인 서는 공익 크지 않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 취지의 경찰청의 형사사건 공보 관련 훈령과 국민의 알권리·언론의 자유 등 가치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비공개 출석해 약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씨는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에야 경찰서에서 나와 귀가했다.
김씨가 당시 경찰서 정문에 모인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강남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취재진 사이에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이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2017년 신축된 현 강남경찰서 건물에 유명인이 공개 출석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단 강남경찰서가 아니더라도 유명인의 경찰 조사 공개 출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례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숨진 고 이선균씨는 사망 전 경찰서 포토라인에 세 차례나 섰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석’을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다.
김씨에게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경찰청 공보 규칙에 따라 대응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언론 취재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은 이해하지만 경찰청 공보 규칙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있다”며 “다만 관례상 언론 취재를 막지 않았던 터라 현장 혼란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를 규정하는 경찰청의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6조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출석 등 수사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유명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때의 공익이 미미하다며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알권리는 원래 공적 권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피의자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권리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명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범죄자 신상공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한다.
한 교수는 “흉악 범죄자의 경우엔 재범 위험이나 관련 범죄에 대한 제보 등 공익을 위해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을 한다”며 “하지만 이미 신상이 다 공개된 유명인은 그렇게 할 공익적 필요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로 인한 명예 실추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요소 부분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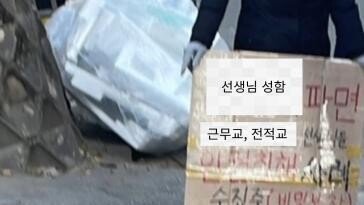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