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무죄 원심 파기
“퇴직 후 상당기간 비밀유지 의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제조법을 찍어뒀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했다면 영업비밀 누설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2016년 7월 삼성전자 2차 협력사인 A사의 생산부 직원으로 일했던 정 씨는 이 회사가 독자 개발해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시리즈에 납품했던 방수 점착제의 제조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8차례에 걸쳐 원료 계량 및 제조 지시서를 촬영한 정 씨는 2곳의 업체로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해 제품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직한 정 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해당 기술에 대해 “상당한 비용이 투입됐고,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영업상 비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조법은 A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라며 “퇴직 이전에 정 씨에게 비밀정보로 고지됐고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됐으며, 그 의무는 퇴직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했을 당시에는 영업비밀을 유출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거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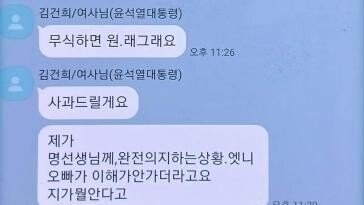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24-06-26 08:53:28
2심 판사놈 무죄 판결 이유 "...우연한 기회로 제조법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