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오, 태어나자마자 ‘덤 인생’이라. 그래서 사는 게 가을바람처럼 훠이훠이 홀가분하다니…. 시인의 능청에 슬며시 웃음이 나온다. 하루하루 사는 게 고행인 나 같은 중생들에겐 ‘너무 높은’ 경지다.
김인식(58) 프로야구 한화 감독도 가끔 “요즘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몸의 오른쪽 반쪽이 마비됐다. 병원을 찾은 많은 야구인은 ‘김 감독이 이제 유니폼을 입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피나는 재활 훈련 끝에 다시 그라운드에 섰고 보란 듯 팀을 정규리그 4위와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시켰다. 김 감독은 아직도 몸이 완전치 않다. 매일 1시간씩 마사지를 받는다. 좋아하던 술과 담배도 끊었다. 교회도 나간다.
감독은 외롭다. 아무리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내색을 할 수 없다.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아니다. 김 감독은 “쌍방울 시절, 숙소에 돌아와 ‘왜 졌는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날이 부옇게 밝아 오더라”며 “식은땀으로 흥건한 유니폼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자신을 깨닫고 너무 외로웠다”고 말했다.
프로스포츠 감독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같다. 경기는 그라운드에서 펼쳐지지만 결국은 사람 관리로 귀착된다. 사람 관리가 잘 되면 선수들은 펄펄 날게 돼 있다. 반대로 사람 관리가 안 되면 최고 선수들만 모아 놓아도 자꾸 지게 된다. 결국 팀워크가 문제다.
한국축구가 2002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지만 당시 멤버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세계 무대에서 거의 무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축구스타 11명을 모아놓은 팀이 반드시 월드컵에서 우승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세계 최고의 명문구단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가 가끔 죽을 쑤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호나우두 지단 라울 호비뉴 등이 버티고 있지만 이들이 따로 논다면 3류 팀에도 지게 되는 것이다.
팀워크를 망치는 것은 불과 몇 사람이다. ‘작은 히딩크’ 박항서 경남도민축구단(가칭) 감독은 이들을 ‘관리 대상자’라고 부른다. 축구의 경우 엔트리에 드는 20명 이후부터 10명 정도가 이 범주에 든다는 것. 30등 밖에 있는 선수들은 스스로 ‘실력 부족’을 인정한다. 김정남 울산 현대 감독은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13명(교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 8명 정도를 그 대상자로 본다.
김인식 감독의 생각도 비슷하다. 프로야구의 경우 엔트리 30명 중 중간층인 13, 14, 15번째 선수가 문제라는 것. 이들은 “주전에 비해 내가 못하는 게 뭐냐”며 쉽게 납득하지 않는다. 이들로 하여금 “언젠가 감독이 나를 써 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감독이 솔직해야 한다. 계산하거나 일부러 제스처를 쓰면 역효과가 난다.
“한 400∼500번쯤 져봐야 선수들을 보는 눈이 좀 생기지. 그래서 전력이 약한 팀은 경험 많은 감독이 좋아. 롯데가 강병철 감독을 선택한 것도 그런 뜻이 아닌가 몰라.”
김 감독의 프로성적은 736승775패 38무. 프로 8개 구단 감독 중 강병철(59) 롯데감독, 김재박(51) 현대 감독, 서정환(50) 기아감독과 함께 ‘50대 4인방’이다. 나머지 4명은 모두 피 끓는 40대 감독.
김화성 기자 스포츠 전문기자 mars@donga.com
스포츠 프리즘 >
-

동아시론
구독
-

HBR insight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포츠 프리즘]“수비형 미드필더 찾습니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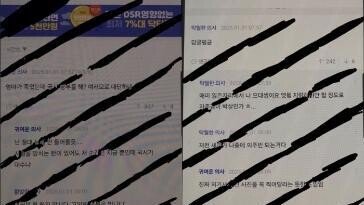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