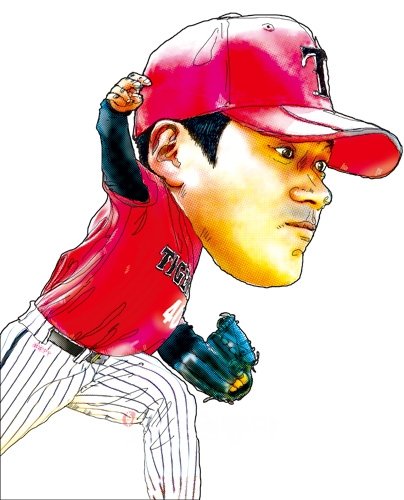
○‘차이’를 알게 된 2008년
2007년 12월 KIA 입단식을 치를 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야구는 만만치 않았다. ‘얕본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의 스타일 차이는 컸다. 한국 타자들은 투수의 독특한 버릇을 잡아내는 데 유독 강했고, 타석에서 서두르지 않고 볼을 기다릴 줄 알았다. 심판에 대한 적응력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1년 전과 다른 요즘
1년 전 이맘때.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적잖게 마음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운동을 게을리했고 그 후유증은 올 시즌 중간 중간, 연이은 부상으로 나타났다. 그런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올 페넌트레이스 종료 직후부터 ‘신인 같은 자세’로 땀을 흘렸다.
경남 남해 마무리캠프에도 ‘열외 없이’ 참가했고, 일본에 자비를 들여 ‘마사지 훈련’을 다녀오기도 했다. 하체를 좀 더 쓸 수 있도록 투구폼도 손질했다. 최근엔 모교인 광주일고와 광주구장을 오가며 동갑내기 친구인 포수 김상훈 등과 함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성공에 대한 확신? 그것은 이번 겨울 쉼 없이 땀을 흘리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다.
○아쉬움은 남지만 후회는 없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왜 야구를 하냐고 물으면 아이는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야구가 좋아서’라는 상투적인 말은 싫었다. 정말 돈을 벌고 싶었고, 그렇게 그는 성공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 면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그의 말. “야구를 하면서 광주일고 유니폼도 입었고(그는 광주일고 졸업생이라는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빅리그 무대에도 섰다. 지금은 어렸을 때 꿈이었던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있다. 거기다가 큰 돈까지 받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닌가.”
그런 그지만 단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 지난해 한국 복귀를 결정하기 전, 일본프로야구 문을 두드렸다. 한 구단과는 사인 직전까지 갔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마음을 흔든 건 가족이었다. ‘지금까지 줄곧 타지에서 고생만 했는데 이제 힘겨운 고생은 그만 하자’는 애원이었고, 그는 결국 가족의 뜻에 따랐다.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현역에서 은퇴하기로 결심한 이상 일본 야구를 접하지 못한 아쉬움은 영원히 풀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그의 말. 그러면서도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는 없다”고 했다.
○나무와 그늘
아버지 서병관씨와 어머니 최경자씨. 같이 야구를 했던 형 재환씨 등 가족은 그에겐 나무와 같은 존재다.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는, 튼튼한 뿌리를 가진 그런 나무 말이다. 부인 이주현씨와 딸 혜린, 아들 종우 그리고 내년 4월 태어날 셋째 아이까지, ‘또 다른 가족’은 그에겐 그늘 같은 존재다. 땡볕에서 지쳤을 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땀을 식힐 수 있는 그런 그늘 같은….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족’을 꼽았고, 그 가족의 의미에 대해 나무와 그늘로 소개했다.
○WBC 탈락, 당연한 일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1차 후보에 들었을 때, 2년 전 같은 대회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서재응은 “이번엔 (최종 엔트리에) 내 자리가 있을까?”라고 했다. “(김)선우 이름도 빠졌는데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 당황스러웠다”던 그는 2차 명단에서 제외되자 “나보다도 훌륭한 투수들이 많이 있다. 스타일상 나는 선발이 아니면 힘들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악착같은 마음가짐 덕분일 것”이라며 올해 재활군에 있는 젊은 후배들을 보며 가끔 호되게 혼을 낸 적이 있다는 일화를 떠올렸다. “수술하고 회복된다고 해도 재활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대강 운동하고, 재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운동 그만두라고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1999년 5월 ‘토미존 서저리’ 이후 근 2년 가까이 암흑의 재활기간을 거쳤던 그는 ‘요즘도 나는 재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10승 투수가 되고 싶다
내년 시즌 목표를 물었다. “내 성적보다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우선이다”던 그에게 ‘개인적인 목표’를 재촉하자 “10승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말이 돌아왔다.
‘서재응이란 이름값을 고려하면 10승 목표는 너무 소박한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래도 답변은 똑같았다. 아니 더 간절한 표정이었다. “20년 가까이 야구를 하면서 난 한번도 10승 투수가 돼 본적이 없다.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바로 10승 투수다.”
서재응이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해는 뉴욕 메츠에서 뛰었던 2003년이었다. 그해 32게임에 등판해 9승12패, 방어율 3.82를 기록했다. 10승에 꼭 1승이 모자랐다. 마이너리그 시절 한해 10승을 올린 적이 있을 법도 하건만 서재응은 “한번도 없다”며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난 10승 투수가 정말 되고 싶다”고 했다. 2008년 서재응의 성적은 16게임에 등판해 5승5패, 방어율 4.08이었다.
광주 |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