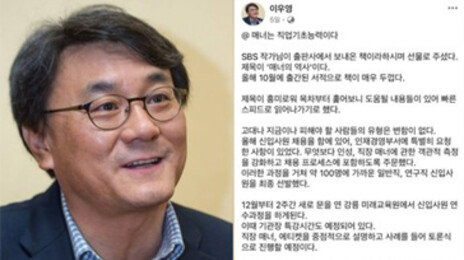1번 키커 박주영·5번 키커 박지성 이었다
![박주영-박지성. [스포츠동아 DB]](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10/06/30/29410152.7.jpg)
한국이 우루과이와 16강전에서 후반 막판 동점골을 뽑아내 연장에 이은 승부차기로 몰고 갔다면?
5000만 국민들은 2002년 6월22일, 광주에서 달성된 4강 신화를 다시 한 번 볼 수도 있었다. 8년 전 ‘영원한 주장’ 홍명보의 발끝에서 4강이 완성됐다면 이번에는 허정무호의 ‘캡틴’ 박지성(29·맨유)의 발끝에서 8강 역사가 탄생할 수도 있었다.
허정무 감독은 16강을 확정한 뒤 세 차례 승부차기 훈련을 했다. 당연한 수순이다. 16강전부터는 무승부가 없다. 전·후반과 연장 30분 등 120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으면 곧바로 승부차기를 한다.
경기 전날 비공개 훈련에서 실시된 승부차기 연습이 진짜였다. 정예멤버 6∼7명 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승부차기 키커에 과연 박지성이 포함될 것이냐 여부였다.
박지성은 2002년 스페인과 8강전 승부차기 두 번째 키커로 나서 골을 성공시켰다.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덜한 순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서전 등을 통해 “승부차기에는 두 번 다시 나서고 싶지 않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며 얻은 큰 경기 경험이 승부차기 순간의 엄청난 압박감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란 판단이었다.
5번 키커 못지않게 기선제압을 위해 중요한 1번 키커는 월드컵 기간 내내 최고의 킥 감각을 자랑하던 박주영(25·AS모나코)의 몫이었다. 2002년 때처럼 해결사가 1번(황선홍)을, 주장이 5번을 책임지는 순서였다.요하네스버그(남아공) |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