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15일은 한국 여성 스포츠계에 의미 깊은 날이었다.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첫 여성 감독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1970년대 ‘나는 작은 새’로 불린 배구 스타 조혜정 씨(58)였다. 3년 계약으로 GS칼텍스 사령탑을 맡은 그는 “선수와 팬 모두가 즐거운 신바람 배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즘 조 감독은 신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얼굴에는 그늘이 짙어간다. 전통의 명문 GS칼텍스는 23일 현재 2승 8패로 꼴찌다. 22일에는 선두 현대건설에 1-3으로 패해 7연패의 늪에 빠졌다.
가장 눈에 띄는 부진 원인은 용병이다. 나머지 구단 용병들이 득점 1∼4위에 올라 있는 반면 GS칼텍스 제시카는 15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득점 성공률도 30%가 안 된다. GS칼텍스는 결국 제시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출신 산야 포포비치를 영입하기로 했다. 주전끼리 경쟁의식이 없다는 것도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는 부진의 원인이다.
조 감독은 ‘엄마 리더십’을 내세웠다. 경기 때는 엄하지만 평소에는 엄마처럼 자상하고 세심하게 선수들을 챙겨주겠다는 의도였다. 일각에서는 되레 그런 행동이 선수들을 더 느슨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 단장을 맡았던 여성스포츠회 정현숙 회장은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지만 뭐든 처음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조 감독이 길을 잘 닦아야 후배들이 꿈을 가질 수 있다.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잘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여성 스포츠계의 상징이다. 어깨가 무겁겠지만 선수 시절 ‘나는 작은 새’라는 별명처럼 사령탑으로도 훨훨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포츠 카페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어린이 책
구독
-

후벼파는 한마디
구독
-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포츠 카페]‘이승훈 전담팀’이 필요한 이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02/10/34700218.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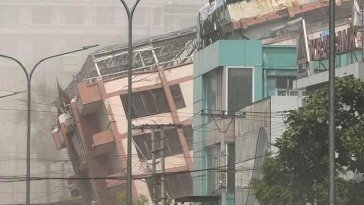

![“6시간 안에 심정지 올 거야, 대비해”… 생명 구하는 AI 예측 기술[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308171.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