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代行 → 감독直行
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간
《프로야구 감독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해군 제독과 함께 남자로 태어나 꼭 한 번 해볼 만한 3대 직업으로 꼽힌다. 감독은 실력과 운이 제대로 맞아떨어져야만 할 수 있다. 평생 한 번 이루기 힘든 꿈이기에 야구인이라면 누구나 궁극적으로 감독을 꿈꾼다. 13일 김경문 두산 감독이 자진 사퇴하면서 차기 두산 사령탑은 누가 되느냐가 야구 관계자와 팬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김승영 두산 단장은 “현재까지 감독 인선과 관련돼 진행 중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은 시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천재일우의 기회
일단 남은 시즌 두산은 김광수 감독 대행이 이끈다. 사령탑 데뷔전이었던 14일 넥센과의 잠실 경기에 앞서 김 대행은 “언제쯤 내가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너무 빨리 왔다”고 했다. 난생처음 지휘봉을 잡은 이 경기에서 그는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감독 대행은 감독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감독 대행 체제가 됐다는 것은 팀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간 대행 꼬리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야신’ 김성근 SK 감독도 2001년 LG에서 감독 대행을 거쳐 정식 감독이 됐다. 그해 이광은 감독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은 김 감독은 98경기에서 49승 7무 42패(승률 0.538)의 호성적을 거두며 이듬해 정식 감독으로 취임했다. 유남호 전 KIA 감독 역시 2004년 감독 대행 신분으로 팀을 포스트시즌에 진출시킨 공로로 이듬해 정식 감독이 됐다. 우용득 전 롯데 감독 역시 감독 대행으로 5할 이상의 승률(27승 1무 22패)을 기록하며 감독 자리에 앉았다. 강병철 전 롯데 감독, 이희수 전 한화 감독 등은 감독 대행에서 감독이 된 첫해 팀을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 대행은 대행일 뿐
감독 대행에서 정식 감독이 된 사람은 10명이 넘는다. 하지만 대행 재임 기간 중 자기만의 야구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부진한 성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는 감독 대행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양승호 롯데 감독은 2006년 중도 퇴진한 이순철 감독을 대신해 LG 감독 대행을 맡았지만 최하위에 그치며 김재박 감독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김용철 전 롯데 감독 대행, 김우열 전 쌍방울 감독 대행, 임신근 전 태평양 감독 대행 등도 결국 대행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프로야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2030세상
구독
-

정세연의 음식처방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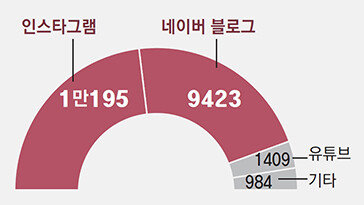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