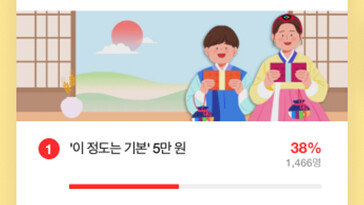한화 김태균(30)은 요즘 ‘아빠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있다. 태어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딸 효린 양 덕분이다.
한때는 아빠를 서운하게 했던 딸이다. 한 달여의 애리조나 전지훈련을 마치고 딱 하루 일시 귀국했을 때, 생후 100일도 안 된 딸은 ‘낯선’ 아빠를 보고 마냥 울어 제쳤다. 그때 김태균은 “스트레스가 더 쌓인 것 같다”며 우울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정이 쌓일 만큼 쌓였다. 이제 제법 애교도 부리는 딸은 김태균이 야구장으로 출근할 때마다 손을 흔들며 방긋방긋 웃는다. 무더운 출근길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5일 오전, 여느 때처럼 집을 나서던 김태균은 당황하고 말았다. 배웅하러 나온 효린 양이 갑자기 와락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알고 보니 ‘가지 말라’는 나름의 의사 표현이었다. 김태균은 “이제는 딸도 ‘아빠가 지금 나가면 한참 지나서 아주 늦게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된 것 같다”며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다. 가슴이 정말 뭉클했다”고 털어놨다. 비록 야간경기와 원정생활로 자주 집을 비워야 하지만, 그 사이 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빠로 자리 잡은 것이다. 폭염 속에서도 4할을 넘나드는 타율을 유지하는 김태균. 딸의 웃음과 눈물에서 힘을 얻는 듯하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